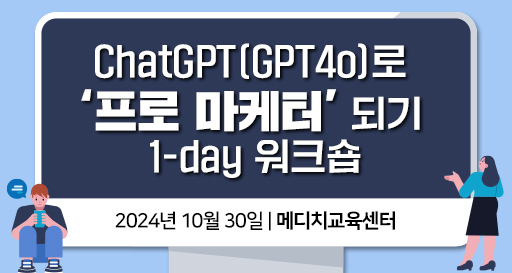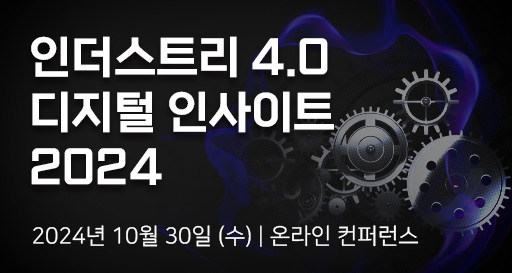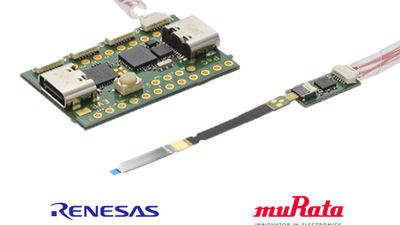#이야기 하나
통신과 방송의 진화과정은 흥미롭다. 마치 결혼과 이혼을 소재로 한, 한 편의 드라마를 연상케 한다.
1837년 미국의 모스가 발명한 전신부호에 의해 처음 시작된 전기통신은 얼마 후 벨이 발명한 전화기로 진화한다. 전파에 의한 무선통신은 1895년 이탈리아의 마르코니가 독일의 헤르츠가 발견한 전자기파와 프랑스의 브랑리가 발명한 검파기에 안테나와 어스를 결합해 시작됐다. 방송도 통신과 마찬가지로 모스의 전신부호, 헤르츠와 마르코니의 무선신호에 의한 라디오 전파로 첫 탄생을 알렸다. 당시에는 방송과 통신의 개념 구분이 없었던 셈이다.
통신과 방송은 이렇게 한몸으로 탄생했다가 1912년 미국 해군이 ‘명령을 무선으로 한꺼번에 여러 군함에 보낸다’는 의미로 ‘브로드캐스팅(broadcasting)’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개념이 분리됐다. 그후 1960년대 컬러TV의 등장으로 방송의 파괴력은 각인됐다. 정확히 표현하면 방송이 전달하는 콘텐츠의 힘이었다. 반면 통신은 보다 많은 정보를 필요한 사람에게 손쉽게 전달하는 네트워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면서 미디어로서 영역을 넓혀왔다.
본디 한몸이었다가 분화된 통신과 방송이 1990년대 들어 디지털화에 의해 다시 융합을 시작한다. 인터넷의 발명으로 통신과 방송의 서비스 개념이 일대다·다대다 양방향의 영상·음성·데이터 커뮤니케이션으로 통합하기 시작한 것이다. 휴대폰과 방송이 결합한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이나 인터넷TV(ITV) 등이 바로 융합에 의한 대표적인 신규매체들이다.
#이야기 둘
“왜 귀사만 다른 매체와 달리 유독 ‘방·통 융합’을 ‘통·방 융합’이라고 표기하는가. 독자들이 헷갈리지 않겠는가.”
요즘 담당데스크라는 죄로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 그때마다 명칭이나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쪽이 소비자들의 니즈에 더 부합할 수 있는가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잘라 말한다. 이해관계 당사자들에겐 어느 것이 앞에 오느냐가 주도권(이니셔티브)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는 몰라도 정작 수요자들에겐 정말 의미없는 일이다. 그야말로 ‘흑묘백묘’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로든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면 그게 통신이든 방송이든 상관없다. 좀 더 싼가격에 고품질의 융합서비스를 어느쪽이 잘하는지가 관심사일 뿐이다.
그래도 굳이 이유를 또 물으면 앞서 설명한 통신과 방송의 진화과정을 얘기해 준다. 통신에서 분화된 방송이 기술의 진보와 소비자의 요구로 다시 한몸으로 가는 것뿐이다. 양측에서 보기엔 고유영역을 뺏기는 듯한 억울함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선택이지 양측의 주장이나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방송이 주장하는 ‘공공성’이나 통신이 얘기하는 ‘산업 육성’은 분명 통·방 융합의 중요한 관점이다. 이를 간과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방·통이 통·방이 된다고 어느 한 쪽이 죽는 것도 아니다. IPTV가 ICOD가 된다고 서비스가 바뀌는 게 아닌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본질도 아닌 용어에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상호간 접점을 찾는 것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적절한 시점에 노 대통령이 의미있는 발언을 했다. 얼마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통령은 “앞으로 공급자의 입장이 아닌, 수요자 위주로 정책을 펼쳐 줄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고 한다. 통·방, 방·통의 경우처럼 이름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았던 모양이다.
무한경쟁이 예견되는 컨버전스(융합)시대에 살아남는 법을 우리나라에선 대통령만이 알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김경묵부국장@전자신문, kmkim@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단독LG CNS·이지스자산운용, 3조 투자 초대형 데이터센터 짓는다
-
2
이통3사, AI 기업 전환…글로벌 협업전략 가동
-
3
국회, 플랫폼 규제 입법 폭주…5개월 만에 16건 무더기 발의
-
4
'빈손 면담' 후 강공 나선 한동훈 “이재명 선고 전 김 여사 이슈 해소해야”
-
5
SK하이닉스, 3분기 영업이익 7조300억…“분기 사상 최대”
-
6
“컨설팅 받고 창업지원금 1억원 손쉽게”…브로커 다시 기승
-
7
SK하이닉스의 CXL
-
8
K잠수함, 폴란드發 잭팟 터지나
-
9
삼성, 갤럭시AI 지원 언어 20개로 확대
-
10
신기한 투명 마이크로 LED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