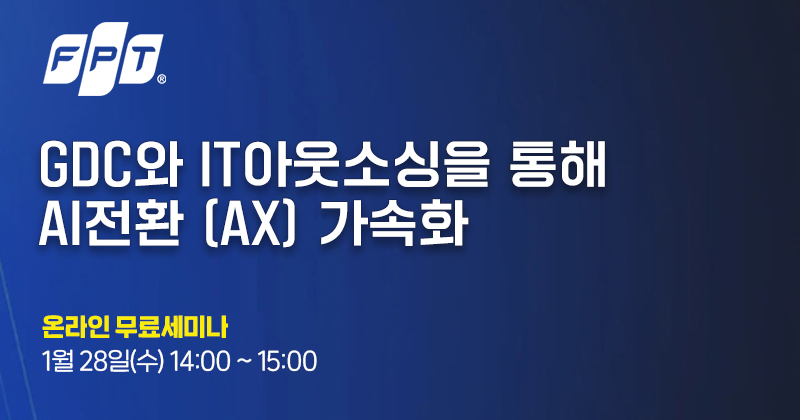중고 휴대폰, 중고 가전, 중고 정보기기에 대한 처리 실태를 물어보면 업계의 반응은 매우 신경질적이다.
기업이 열심히 중고·폐가전을 모아 재처리를 한다고 해도 늘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기업은 나름대로 리사이클링센터를 만들어 운영하는 등 중고 휴대폰, 중고 가전, 정보기기를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인식하려고 노력중이다.
국내 가전업체들로 구성된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회장 김영기 LG전자 부사장)는 전국 32개 회원사의 3500개 판매대리점과 물류센터를 통해 폐가전 제품을 처리해 연간 143억원의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등 가전4사 등도 직·간접적으로 재활용센터를 운영,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환경시민단체의 눈은 여전히 차갑다. 도로변에 버려진 폐가전 제품과 책상서랍에서 나뒹구는 중고 휴대폰 등이 널려 있기 때문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등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EPR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 PC가 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이다. 이 품목 중 냉장고, 세탁기의 경우는 80∼90%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폐가전 제품의 회수율은 대기업에 그친다.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회수망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휴대폰, 면도기, MP3플레이어, 오디오, 전동칫솔, 선풍기 등 중소기업에서 만든 제품들은 회수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그야말로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려지든지, 자체 소각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사용될 수 있는 중고 제품도 이런 식으로 버려진다. 결론은 환경오염이다.
업계는 생산자 중심의 재활용 책임 의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생산자 중심의 재활용 책임의무는 실제 고객과 접점에 있는 유통과 판매점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다. 생산자는 ‘재활용’을 책임지고, 유통 및 판매점은 ‘제품 회수’를 책임져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는 그 일례로 전자제품 재활용 의무량 제도를 꼽는다. 생산자에게 할당된 재활용 의무량을 맞추기 위해 정해진 수치의 중고전자제품을 억지로 구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어떤 PC제조회사의 경우에는 아예 직원들에게 할당량을 매겨 중고 PC를 구해오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보다 본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중고 휴대폰, 중고 가전을 재활용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해 만든 제품들을 더는 쓰레기로 방치하지 말자는 주장이다. 중고 가전 제품을 분해해 금·은 등 소량의 금속 산화물을 추출하는 형식도 있지만 극히 제한적인 재활용에 그친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사용가능한 중고 제품을 제3국에 수출하는 방식이다.
우리와 유사한 통신시스템을 구축한 나라에 중고 휴대폰을 수출하는 방법, 중고 가전을 수출하는 방법은 타당해 보인다. 물론 수출에 따른 물류비용, 유통비용 및 해당국의 표준문제를 살펴봐야 함은 당연하다. 휴대폰의 경우 중국, 동남아 등지가 수출대상으로 꼽힌다. 아직 흑백폰을 활용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이들 나라에서 우리나라 중고 휴대폰은 첨단 통신기기 제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디지털TV(DTV) 시대를 맞아 아날로그 TV 재활용방법도 고려해봄 직하다. 보급형 DTV의 등장으로 가정 내에서는 엄청난 속도의 DTV 교체수요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된다. 수년 내 1000만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DTV수요에 맞춰 우리나라는 기존 아날로그 TV가 중고·폐가전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이러한 중고 TV에 대한 수출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우리와 사용 주파수 대역이 유사한 곳, 방송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제3세계 등에 장비와 단말기를 수출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중소형 냉장고, 세탁기 등 앞으로 등장할 무수한 디지털 단말기도 마찬가지다. 폐기물을 자원으로 보는 긍정적인 시각과 대책이 필요하다.
김상룡기자@전자신문, srkim@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1분기 낸드 가격 100% 인상…“공급이 수요 못 따라간다”
-
2
단독약값 연간 4000만원 치매 신약 '레켐비' 처방 1년 새 27배 폭증
-
3
CJ대한통운, '1일 1배송' 공식 깨나…'2회전 배송' 실험에 '과로 재현' 우려
-
4
단독'산업안전 R&D법' 제정 추진…과학기술로 중대재해 막는다
-
5
제미나이3·나노바나나 뜨자 클라우드도 들썩…MSP 업계, GCP 사업 강화
-
6
"아이폰17 타고 날았다"... LGD·LG이노텍, 지난해 4분기 호실적 예고
-
7
LG엔솔, 韓 최초 차세대 '소듐 배터리' 생산 시동
-
8
K-조선, 美 거점 확보 속도…마스가 정조준
-
9
단독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위헌 허들 넘었다
-
10
'민주화 거목' 이해찬 前 총리 별세…베트남 출장 중 '비보'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