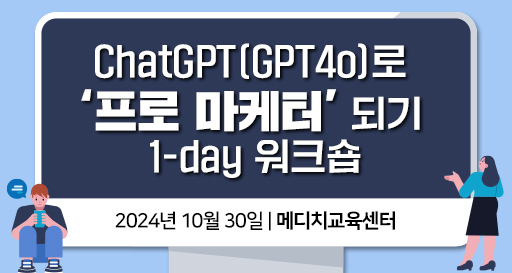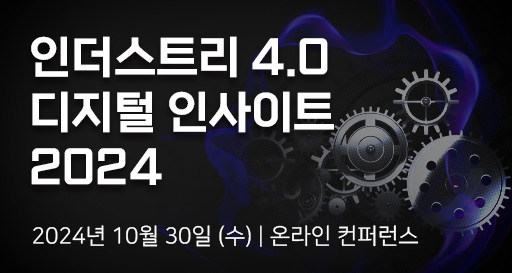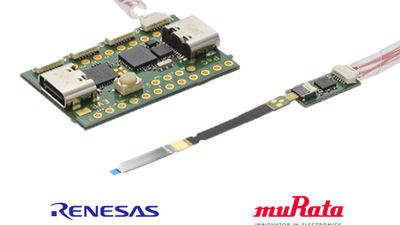◆<이윤재 증권금융부장 yjlee@etnews.co.kr>
지난 97년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을 때 미국은 한국기업의 높은 부채문제와 함께 불투명성을 질타했다. 그래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사업을 매각하거나 인력을 정리하는 등 뼈를 깎아내는 수술을 단행했다.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뒤따랐다. 상장기업들의 영업실적 공개를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시켰으며 자발적으로 월간 영업실적을 공개하는 기업도 늘어났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어떠한가. 엔론에서부터 불거져 나온 회계조작 의혹이 정보기술(IT)업체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또 이러한 의혹이 제기된 기업은 예외없이 주가가 폭락하는가 하면 시장 안팎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어떤 기업은 이를 해명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진땀을 흘리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우리기업들은 어떤 느낌일까.
기업의 투명성은 공개된 시장경제 환경에서는 기본적인 덕목이다. 따라서 폐쇄된 경제체제를 벗어나지 못한 후진국보다는 자본주의가 발달한 선진국가에서 기업의 투명성을 더 많이 요구받는다. 공개시장에서는 기업을 감시하는 눈길이 그만큼 많을 뿐만 아니라 투명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선 주가폭락과 같은 가혹한 형벌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은 이러한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국가로 꼽혀왔다. 이번 미국기업들의 회계조작 의혹파문이 주는 충격은 그래서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굳이 미국기업들의 양면성을 지적한다면 국내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미국기업들은 국내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금감원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실적도 자발적으로 대외에 공개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본사의 주가에 조금이라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설사 홍보용이더라도 절대 함구한다. 현지법인인 만큼 본사의 정책과 지시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해 보인다. 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는 본사는 알몸을 다 드러내 보이면서도 현지법인에 대해선 갑옷으로 철저하게 감추도록 하는 것이다. 철저한 현지화의 결과일까. 비즈니스 역시 국내기업보다도 더 한국시장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듯하다. IT비즈니스의 경우 미국 본사가 정하고 있는 경영윤리의 선을 살짝 넘나드는 곡예를 펼치면서까지 한국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성숙한(?) 현지법인도 있다.
이로 인해 국내기업들은 외국계 기업과의 시장경쟁에서 역차별을 겪고 있다고 종종 푸념하기도 한다. 국내(상장)기업은 영업실적이나 재무상황 등이 상세하게 노출돼 있지만 정작 외국계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게 없기 때문이다. 미국시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본사의 분석자료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현지법인에 대한 정황을 추론하는 것이 고작이다. 더욱이 미국시장에서는 기업이 철저한 기업윤리를 바탕으로 투명경영을 실천하지 않으면 곧바로 철퇴를 맞는데, 한국시장에서는 미국기업의 현지법인에 대한 감시기능이 너무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또 이러한 맥락에서 해외현지법인을 포함한 미국기업의 연결재무제표가 완벽하게 투명할 수 있겠는가 하는 데도 의문을 남기고 있다.
한국기업이든 미국기업이든, 앞으로 투명경영은 더욱더 강하게 요구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공급자 중심의 산업경제 시절에는 기업(경영)비밀이 시장경쟁의 중요한 무기로 작용했지만 수요자 중심의 디지털경제 환경에서는 정보교류가 활발한 공개경쟁을 피할 수 없다. 그동안은 기업이 시장을 지배했다면 이제는 시장이 기업을 지배하는 세상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투명경영을 도외시하는 기업은 시장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으며 또 이러한 환경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생각이다.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단독LG CNS·이지스자산운용, 3조 투자 초대형 데이터센터 짓는다
-
2
이통3사, AI 기업 전환…글로벌 협업전략 가동
-
3
SK하이닉스, 3분기 영업이익 7조300억…“분기 사상 최대”
-
4
“컨설팅 받고 창업지원금 1억원 손쉽게”…브로커 다시 기승
-
5
SK하이닉스의 CXL
-
6
K잠수함, 폴란드發 잭팟 터지나
-
7
삼성, 갤럭시AI 지원 언어 20개로 확대
-
8
국감서 욕설 논란 방통위 김태규…과방위, 국회 모욕죄로 고발 결정
-
9
신기한 투명 마이크로 LED
-
10
[SEDEX 2024]반도체 업계, 차세대 메모리·첨단 패키징 '미래 먹거리' 공략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