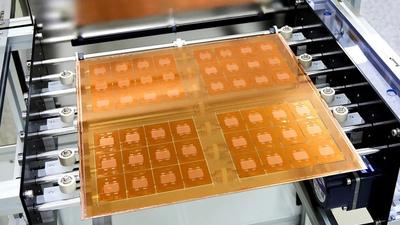외국 영상물·음반 등의 수입 추천과 등급 부여, 광고·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 확인 등 영상물과 관련해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핀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지난 8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관계법 개정으로 지난 97년 설립된 공연예술진흥협의회(공진협)가 폐지됨에 따라 새로운 법정 민간단체로 발족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이름에도 「심의」란 단어를 쓰지 않으려 애쓴 흔적이 역력한 것만큼이나 설립 목적과 위원 구성, 규정에 있어 공진협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영상물등급위는 우선 과거 공연윤리위원회나 공진협과 달리 영상물에 대한 제한·삭제·사전심의가 아닌 연소자 관객 보호와 등급분류만을 전담한다. 광고 선전물도 사전심의에서 사후·선별심의로 바뀌었고 「사실상의 삭제압력」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영상물에 대한 등급판정 보류기간도 3개월 이내로 단축했다.
회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해 심의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 한 것도 그동안 심의결과에 대해 심심찮게 제기됐던 「고무줄 잣대」라는 형평성 시비를 없애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영상물등급위는 앞으로 본격적인 실무 처리를 위해 영화·비디오·가정용게임·업소용게임·가요음반·무대공연 등 6개 소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소위의 심의는 예심과 본심의 등 복심체제로 운영해 객관성을 보장하겠다고 한다. 이같은 규정들이 제대로 운용될 경우 등급 분류에 대한 시비는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선 영상업계에서는 등급체계가 종전 공진협 시절 4개 등급에서 3개 등급으로 축소돼 가뜩이나 등급을 받기가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 가운데 업계 사정에 밝은 사람이 드물고 그동안 매체를 「감시」해온 인물들도 더러 포함돼 있는 점을 적잖이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제도의 틀 자체는 완화됐지만 위원회가 규정을 경직되게 운영할 경우 업체들의 실제 체감지수는 과거보다 오히려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 개정돼 발효중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과거 법에 비해 비록 많은 부분 개선됐다고 하지만 산업계의 불만을 잠재우지는 못하고 있다.
극장 상영된 영화를 또다시 비디오물로 심의받도록 한 것과 「18세 이용가」 등급의 게임을 150평 이상의 종합게임장에만 허용한 것 등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대부분 영세한 PC게임방과 게임 개발·유통사들은 기존의 게임물이 새로 등급 분류되는 과정에서 일반 PC게임방에서 취급할 수 없는 「18세 이용가」 등급으로 재분류될 경우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 속에 위원회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PC 패키지게임과 온라인게임의 구분이 점차 모호해지고 있음에도 PC게임은 영상물등급위가, 온라인게임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별도로 관장하고 있는 점과 양측 등급의 잣대가 차이나는 것도 분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등급 외」 등급이 마련되지 않은 탓에 불가피하게 내려질 「등급보류」로 인한 시비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영상물등급위에 음비법 등 관계법령의 미비나 현실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손질하는 등 「권한 밖의 일」을 요구하려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위원회가 사실상 이들 법을 현장에 적용하는 첫 관문이자 스스로 변할 수 없는 법률·법령과 달리 상황에 따라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의 회의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도외시한 채 「업자」와 야합하거나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되겠지만 자구해석에 지나치게 묶여 탄력을 잃는 것 또한 「민간자율」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
위원회 규정에 위원회가 상영등급을 분류한 영상물 등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등급 분류 등 관련업무에 반영토록 한 것도 구조적으로 현실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법의 한계를 위원회가 슬기롭게 보완하라는 뜻이 아니겠는가.
위원회가 공정하면서도 탄력성 있는 운영으로 소비자와 산업계 모두를 감싸안을 수 있는 기구로 오래 남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모토로라 중저가폰 또 나온다…올해만 4종 출시
-
2
단독개인사업자 'CEO보험' 가입 못한다…생보사, 줄줄이 판매중지
-
3
LG엔솔, 차세대 원통형 연구 '46셀 개발팀'으로 명명
-
4
역대급 흡입력 가진 블랙홀 발견됐다... “이론한계보다 40배 빨라”
-
5
LG유플러스, 홍범식 CEO 선임
-
6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7
반도체 장비 매출 1위 두고 ASML vs 어플라이드 격돌
-
8
페루 700년 전 어린이 76명 매장… “밭 비옥하게 하려고”
-
9
127큐비트 IBM 양자컴퓨터, 연세대서 국내 첫 가동
-
10
'슈퍼컴퓨터 톱500' 한국 보유수 기준 8위, 성능 10위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