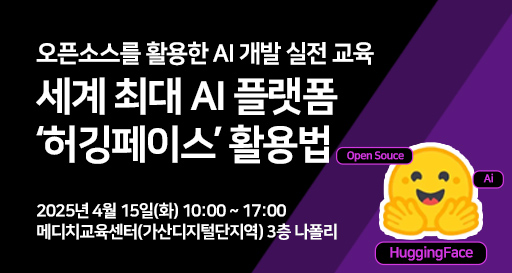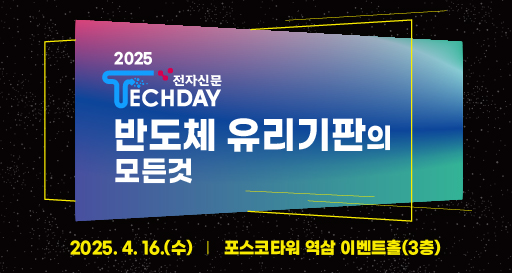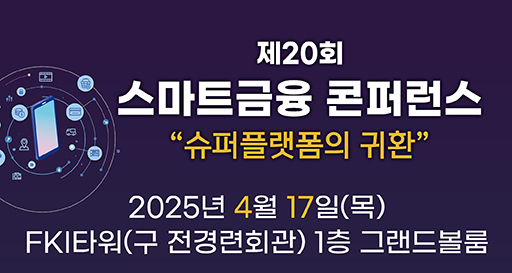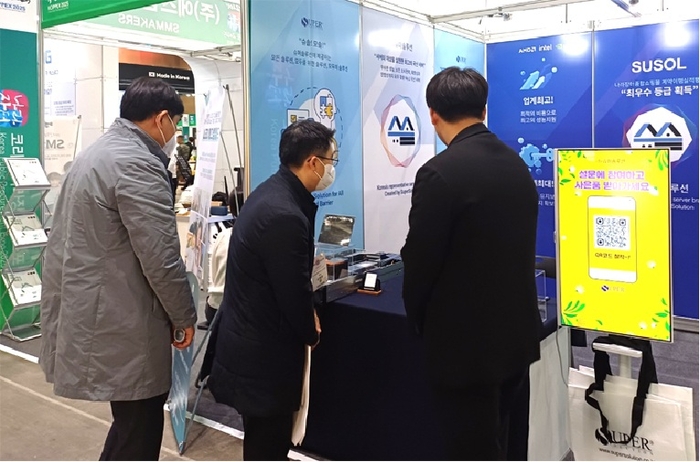1910년 9월 어느 날, 일본인 한 사람이 경복궁 부근의 창고를 열심히 뒤지고 있었다. 그는 산더미처럼 쌓인 채 쓰레기에 섞여 썩어가던 고서와 종이뭉치들 속에서 몇몇 책을 끄집어냈는데 각각 「풍운기」 「천변초출등록」 「성변측후단자」 등의 제목이 붙어 있었다.
일본인의 이름은 와다 유우지. 대한제국 농상공부의 관측소 소장으로 6년여 동안 재직하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는 우리나라 전통과학과 그 유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자료를 발굴해낸 사람으로 이미 1910년 2월에 우리나라의 기상관측 자료 등을 조사해 「한국관측소 학술보문 제1권」을 도쿄에서 출판한 바 있었다.
그가 찾아낸 「풍운기」는 조선시대의 천문대였던 관상감의 관측원부이며 「천변초출등록」은 춘추관에 제출하던 관측연보였다. 그리고 「성변측후단자」는 혜성관측 보고서로서 나중에 서구의 천문학자들을 놀라게 한 기록이다.
특히 이 책에는 17세기 말에 석달 가까이 나타났던 대혜성을 하루도 빠짐없이 관측한 기록이 있는데 세계 천문학 사상 유일한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귀중한 기록들이 왜 창고에서 썩어가고 있었을까? 나라를 일제에 빼앗기면서 우리의 과학 유산들까지도 일본인의 손에 내맡겨버렸던 것일까? 이런 상황의 배경에는 조선 후기 들어 서서히 몰락해버린 우리 전통 천문학의 슬픈 위상이 반영되어 있다.
왕립 천문기상대였던 관상감은 원래 서운관이라 불렸는데 1466년 세조 때에 이름이 바뀐 것이다.
관측소는 궁궐 안팎에 하나씩 두 군데가 있었지만 임진왜란 때 모두 불타 없어지고 말았다. 이렇게 맥이 끊어진 천문관측소는 오랫동안 복원되지 못하다가 19세기 말 대원군이 경복궁을 재건할 때에야 비로소 다시 세워졌다. 1872년의 일이다.
그러나 이미 발달된 서구 문물이 많이 들어와 있던 때라 예전의 규모를 되찾지는 못하고 겨우 시간을 재거나 달력을 만드는 정도에 머무르게 되었다. 결국 관상감은 1894년에 관상소로 격하되었고 직원도 7명 안팎으로 줄었다. 조선시대 초기 관상감의 정원 70명에 비하면 무려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버린 것이다. 게다가 관측소의 실질적인 운영은 일본인이 하고 있었다. 이렇듯 천문관측이 점점 사람들의 관심을 잃어가면서 500여년 동안 관측한 기록들은 창고에서 썩어갔다.
와다 유우지는 조선시대의 천문기상 관측기록들이 매우 훌륭하고 귀중한 유산임을 깨닫고 1차로 펴낸 「학술보문 제1권」에 이어 경복궁 관상감의 묵은 기록들을 발굴, 보존하고자 창고를 뒤졌던 것이다.
중세기의 우리나라 천문학은 동양 제일을 자랑했다. 세종대왕 대에 경복궁 안에 세워진 천문관측소인 간의대는 원나라의 곽수경이 세운 관성대 이후 동양에서는 가장 큰 규모였다.
관리들이 매일 밤 5명씩 조를 짜 관측에 임했던 간의대는 당시 동양 최고시설을 갖추어 외국 사신들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이 시설은 임진왜란 때 파괴된 뒤 다시는 복구되지 못했고 이후 천문학의 맥을 이으려는 임금이나 학자가 없어 결국 구한말의 비참한 관측소로 전락하고 말았다.
세기말에 이른 현재 서구의 물질문명은 그 가능성 못지 않게 문제점도 많이 노출하고 있다. 이제는 완전히 서구문명에 편입된 우리로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한 「다른 과학, 다른 문명」의 가능성이 많은 아쉬움으로 다가온다.
조선시대 천문학의 서글픈 전락을 반추해보면 그런 생각이 더욱 절실하다.
<박상준·과학해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