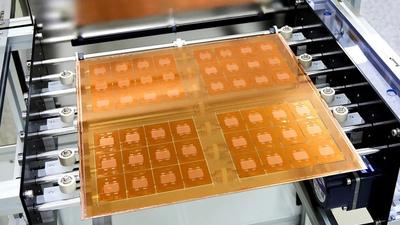폐가전 제품 재자원화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환경보전과 산업활성화 논리가 맞부닥친 결과다. 환경당국은 어떻게 해서라도 환경을 보전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고 업계는 이러한 정책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양자의 시각차가 커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일견하는 것만으로 해결되기에는 문제가 중하다.
폐가전품 처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양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이다. 보급 포화상태를 맞은 가전제품의 경우 지난 한해 동안 무려 7만2천여톤이 버려졌다. 특히 폐가전제품 배출량은 앞으로 2000년까지 연평균 5.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전품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회수, 처리는 더욱 어려워 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반도를 깨끗이 보전해 후세에 물려줘야 한다는 점에서는 환경당국자나 전자업계 모두 생각은 일치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폐가전품 회수, 처리 정책에는 아쉬움이 있다. 정부는 폐가전품을 회수, 처리하기 위해서 생산자에게 폐기물 예치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적용 품목도 확대해가고 있다. 또 소비자에게는 배출수수료를 매기고 있다.
폐기물 예치금은 생산자가 예치했다가 폐가전품을 회수하면 되돌려 받는 것이다. 그렇지만 생산된 제품을 가전업체가 완전히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폐기물예치금과 배출수수료는 상당부분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데 대한 대가인 셈이다. 그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 또 그 돈을 폐가전품을 회수, 처리하는데 쓴다면 당연하기조차 하다. 그런데 정부는 폐기물예치금을 지난 94년부터는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통합 운용함으로써 가전제품을 회수, 처리하는 데 직접적으로 쓰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현재 가전제품의 회수는 가전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데 공동 집하장이나 처리장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수도권에서는 자원재생공사가 이를 처리하고 있으나 경제규모가 안돼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소량이긴 하지만 납이나 형광물질, 국제적으로 사용이 규제되고 있는 염화불화탄소(CFC) 등이 분리 회수되지 않고 일반 쓰레기처럼 처리된다면 환경은 오염될 수밖에 없다. 또 철이나 비철금속 등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도 그냥 버림으로써 국가적 낭비가 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폐기물 예치금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 등 3사는 중부, 호남, 영남권에 리사이클링센터 건립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가전업체들이 수백억원을 투입해 리사이클링센터를 건립하더라도 그것을 유지하는 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 것이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가전제품의 원가상승으로 경쟁력을 약화시켜 산업의 활성화에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폐가전품을 잘 회수, 처리해 환경을 보전하면서 가전업체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느냐이다. 폐기물 예치금 요율을 올린다고 해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폐가전품을 회수해 재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경제원리에 따라 운영, 유지케 하는 것이 긴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을 완비하는 것이 급선무다. 우선 수도권 지역부터라도 자원재생공사에 자금을 지원해 폐가전 제품을 재자원화할 수 설비를 구축하게 하는 것이다. 이같은 방법은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공사가 폐가전품 리사이클링센터를 처음부터 건립하게 하자는 것이다.
더 현실적인 방법은 현재 가전업체들이 건립하고 있는 리사이클링센터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가전업체들이 폐가전품을 효율적으로 재자원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리사이클링센터를 짓고 유지하는 것이 가전업계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한다면 이같은 방법은 결국 흐지부지 되고 말 것이다.
리사이클링센터는 자원재생공사가 건립주체가 되든 가전업계가 운영하든 기본적으로 환경보전이라는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그동안 거둬들인 폐기물예치금을 이용해서라도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하겠다. 그것이 환경보전과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잡는 길이다.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모토로라 중저가폰 또 나온다…올해만 4종 출시
-
2
단독개인사업자 'CEO보험' 가입 못한다…생보사, 줄줄이 판매중지
-
3
LG엔솔, 차세대 원통형 연구 '46셀 개발팀'으로 명명
-
4
역대급 흡입력 가진 블랙홀 발견됐다... “이론한계보다 40배 빨라”
-
5
LG유플러스, 홍범식 CEO 선임
-
6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7
반도체 장비 매출 1위 두고 ASML vs 어플라이드 격돌
-
8
페루 700년 전 어린이 76명 매장… “밭 비옥하게 하려고”
-
9
127큐비트 IBM 양자컴퓨터, 연세대서 국내 첫 가동
-
10
'슈퍼컴퓨터 톱500' 한국 보유수 기준 8위, 성능 10위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