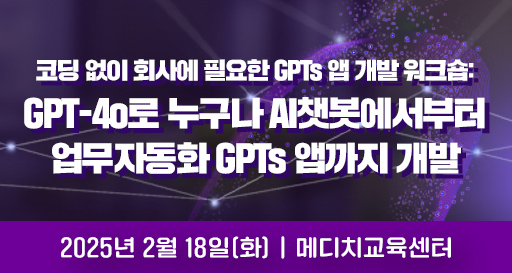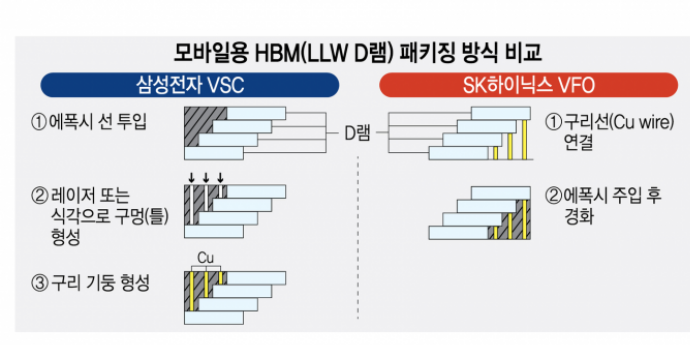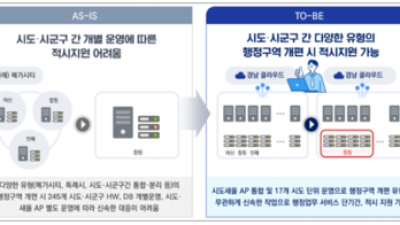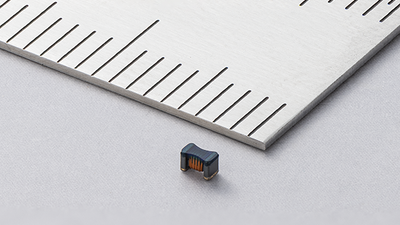『애써 국내에서 ISO인증을 획득하면 뭐합니까? 해외에서는 인정해주지 않는데요.』
최근 전기진흥회 회의실에서는 한 중전기 제조업체 간부로부터 이같은 질타성 발언이 터져나왔다. 「EM」을 비롯 「NT」, 「KS」, 「ISO」, 「KT」, 「EQ」, 「Q」, 「고」 등 갖가지 인증이나 마크가 제조업체에게는 사실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어 『같은 ISO인증이라도 해외에서 받는 것과 국내에서 받는 것이 다르다』며 『수출을 원하는 기업은 해외에서 다시 취득해야 할 형편』이라고 털어놓았다.
전기관련 품질인증 가운데 「EM」과 「NT」, 「KS」, 「ISO」 등은 국립기술품질원이 주관기관이고 「KT」는 과기처, 「EQ」는 전기조합, 「Q」는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고」는 한전영업처가 주관기관이다. 이처럼 각 기관별로 인증, 마크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품질인증제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비단 전기공업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수출을 불황탈출의 대안으로 강구하고 있는 전기공업계는 다른 어떤 업종보다도 인증제도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일례로 무정전전원장치(UPS) 업체인 T사는 회사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형식승인제에 따른 「전」마크를 비롯 ISO인증, 「Q」마크 등 품질인증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것들을 취득했지만 해외진출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
T사 관계자는 『ISO인증을 취득하는데만도 수천만원이 들었고 앞으로 이를 유지, 관리하려면 전담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등 부담이 크다』며 『비싼 돈과 인력을 들여 취득한 인증, 마크가 유명무실한게 한두 분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품질인증제는 당초 제조업체의 품질수준을 높임으로써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품질인증이나 마크를 획득한 업체는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받거나 관급물량을 배정받는데 우선순위를 차지해 왔었다. 이러한 품질인증 제도는 전기관련 업체들의 품질향상에 적잖이 기여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들어 업체들에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기진흥회의 한 관계자는 『차별성이 없어진 탓』이라고 지적한다. 국내 품질인증 관련기관의 느슨한 심사로 인해 너도나도 인증이나 마크를 취득함에 따라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평준화됐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이렇게 되면 당연히 해외 인증기관도 한국내 인증에 대해 불신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미 국내 모 기관으로부터 ISO인증을 받은 K회사 사장은 『ISO인증을 그다지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었다』며 『국내의 인증은 대부분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ISO같은 인증은 해외의 인증기관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고 상호인증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해외시장에 진출해서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실수요자가 선진국의 인증제품을 원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증 및 마크와 관련된 문제점이 현실로 나타남에 따라 전기공업계 일각에서는 「인증 및 마크 통합론」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UL처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증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선진국들이 자국의 이익에 맞도록 각종 인증 및 규정들을 개발, 변경해나가는 점을 감안하면 전기공업계의 이같은 주장은 국가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선결돼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박영하 기자>
전자 많이 본 뉴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