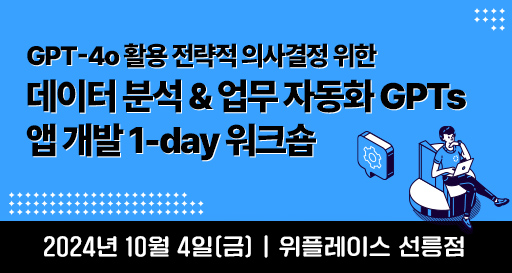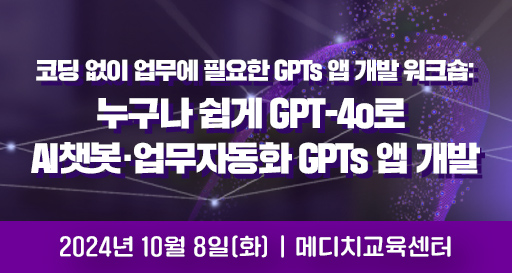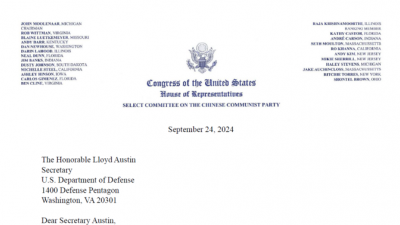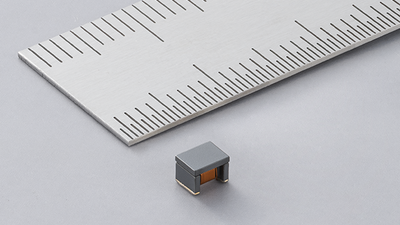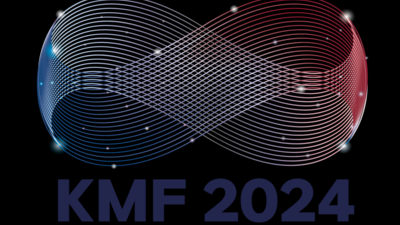싱가포르에 아시아 금융허브 자리를 내줬던 홍콩이 절치부심 새로운 금융허브에 깃발을 꽂으려 하고 있다. 이름하여 아시아 ESG 금융허브와 가상자산 허브다.
우선, ESG 금융허브는 2월 16일 구체화되기 시작했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홍콩정부가 수익률 4.05%, 발행규모 8억 홍콩달러(약 1311억원)의 녹색 채권을 발행했다. 블록체인 기반 세계 최초라는 점에서 ESG 금융허브 가능성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그동안 발행된 상당수 녹색 채권은 워싱(Washing : 가짜)일 것이라는 의심이 많았다. 하지만, 위·변조를 방지하는 블록체인을 활용함으로써 워싱 논란을 잠재웠다는 평가다.
물론 ESG 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하려면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 인프라만 갖췄다고 되는 건 아니다. 다양한 ESG 금융상품과 시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홍콩이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 이유로 첫째, 홍콩이 싱가포르에 아시아 1위 자리는 내줬지만 여전히 아시아 2위이면서 뉴욕, 런던, 싱가포르에 이은 세계 4위 금융허브라는 점을 꼽는다. 그만큼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 수요가 충분한 셈이다.
둘째, ESG 금융상품 공급도 홍콩만한 곳이 없다는 평가다. 홍콩의 ESG 금융 잠재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제기후채권기구(CBI)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녹색 채권 누적발행규모는 중국이 854억 달러(약 109조원)로 세계 1위고, 절반 이상을 홍콩을 통해 발행하고 있다. 세계 최대인 중국 탄소배출권시장(연간 거래량 40~50억톤)을 뒷배로 두고 있는 점도 다양한 ESG 금융상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다. 급증하고 있는 탄소배출 관련 친환경 금융수요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ESG 금융수요나 공급 모두 홍콩 잠재력은 그야말로 막강하다.
가상자산의 경우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 허브를 노린다는 평가다. 홍콩정부가 최근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친가상자산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시장 변화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 정책은 지난해 10월 30일 발표한 가상자산 진흥정책과 올해 6월 1일 가상자산시장 개방 가이드라인 등 두 가지다.
이에 따라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인 미국 비트마트, 중국 게이트아이오 등이 홍콩거래소를 출범시켰고, 홍콩 최대은행인 HSBC는 홍콩 소재 은행 중 최초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거래서비스를 개시했다. 기관과 거액 개인(13억원 이상) 외에 소액 개인투자자도 가상자산거래가 가능해졌다.
홍콩정부는 향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외 추가 토큰 상장은 물론, 가상자산 거래소 허가확대 등 적극적 가상자산 정책행보를 시사하고 있다.
홍콩정부는 왜 이렇게 가상자산에 대해 적극적일까. 전문가들은 중국정부가 홍콩을 가상자산이란 새로운 금융허브로 만들려는 것 이외에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시진핑 주석 3연임 등을 이유로 빠져나갔던 자금, 소위 차이나런 유턴을 노리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꼽는다.
또,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디지털 위안화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특히 디지털 위안화의 국제화는 최근 중국이 힘을 쏟고 있는 페트로 위안화(위안화 원유결제)와 함께 달러패권을 흔들려는 중국의 대미전략 일환이기도 하다.
그럼 홍콩의 가상자산 허브는 성공할 수 있을까. 의견이 분분하지만, 개인적으로 성공확률이 꽤 높다는 의견에 한표를 던지고 싶다. 왜냐하면 미국 SEC의 광범위한 가상자산 규제로 가상자산거래소 등 관련업체의 '미국 엑소더스'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데다, 블록체인 기반 ESG 녹색 채권도 토큰화된 채권이어서 가상자산과 연결,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금융 중심지를 통해 홍콩·싱가포르와 차별화하려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꼼꼼한 분석을 통해 신속하면서도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란 생각이다.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겸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