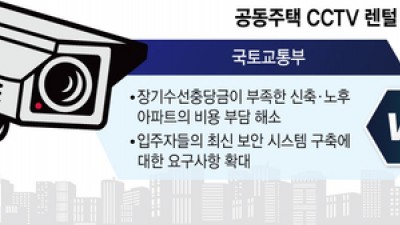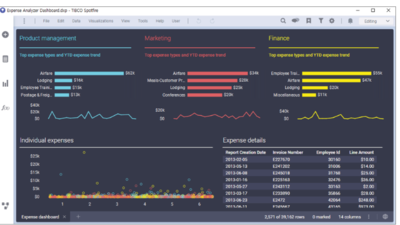KT가 민영화된 지 20년이 지났다. 여전히 정치권 일각에서는 '反민反관' 기업으로 통한다. 포스코와 더불어 주인 없는 소유분산 대표 기업으로 꼽힌다. 두 회사의 대표 자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풍에 시달린다. 이른바 개국공신들이 선호하는 0순위 자리다. 현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여권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무언의 시그널을 보낸다. 국민연금은 행동대장을 자처했다. 총대를 멨다. 3월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을 예고했다. 사실상 구현모 KT 대표 연임 불가론을 공식화했다. 물론 '용산'은 일정거리를 둔다. 아웃복싱을 하면서 관망한다.
구 대표는 연임할 수 있을까? 연임에 성공할 경우 경영 불확실성은 사라질까?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숫자다. 경영지표는 합격점이다. 구 대표는 KT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디지코'라는 디지털플랫폼 기업으로 변신시켰다. 12년 만에 내부 출신 최고경영자(CEO)로서 경영 성과를 냈다. 2020년 1월 7조원이던 시가총액이 2022년 8월 기준 10조원을 돌파했다. 취임 당시 2만원을 넘지 못하던 주가 역시 3만400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다는 것을 제외하고 눈에 띄는 핸디캡은 없다. 성과가 증명한다. 최근 정부가 강조하는 기업가치 극대화, 고객 이익 증대라는 스튜어드십 취지에도 부합한다. 이론상으로 연임에는 별다른 무리가 없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의도를 거치지 않은 정치인이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지 않았다. 이른바 '0선'의 정치 신인이 몇 개월 만에 최고 권좌에 올랐다. 한국 정치사에 획을 긋는 반란이었다. 대이변이었다. 국민들이 그에게 국가통수권을 위임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기존 여의도 정치에 신물이 났거나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극에 이르른 탓이었다. 결과적으로 '공정'이라는 시대정신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그는 여의도가 아닌 '서초동 문법'에 충실했고, 결국 성공했다.
우리 현대사는 선거가 열리는 5년마다 되풀이됐다. 대통령제 시스템은 한마디로 승자독식이다. 대선에서 이긴 진영이 모든 걸 가진다. 이른바 공신록 등급에 따라 논공행상도 이뤄진다. 전 정부 출신 공공기관장 등에게는 무언의 사퇴 압박도 간다. 방송통신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구 정권이 대치하고 있다. 고래싸움에 공무원 등으로 불똥이 튀었다. 방통위 공무원 일부는 구속 상태다.
익숙한 관행이다. 물론 과거 블랙리스트 사건을 교훈 삼아 압박 메시지는 에둘러 표현된다. 간접적이다. 정무적 판단을 기다릴 뿐이다.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난 수십년 동안 여의도 정치가 그렇게 해 온 방정식이다.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최상위층에서 이 같은 사태는 5년마다 벌어진다. 얼마나 소모적인가.
이제는 법률과 제도적으로 풀어야 한다.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갈 용산식 해법을 시스템화해야 한다.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는 연동시켜야 한다. 그렇게 되면 알박기 인사 논란도 해소될 수 있다. 구조적으로 통치 철학을 함께하는 이들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 소유분산기업 해법도 마찬가지다. 성과 있는 CEO에게는 중장기 전략으로 경영할 수 있게 보장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집권 2년 차에는 변화와 혁신도 구체화해야 한다. 구태와 관성도 타파해야 한다. 올해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드라인 해다. 지금 시작해야 한다. 용산시대에 걸맞은 대한민국 재구조화 작업이 필요하다.

김원석 통신미디어부 부국장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