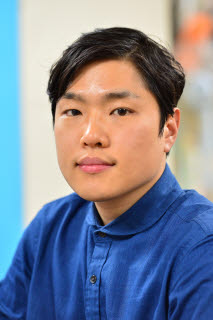
헬스케어 업계에 혹한(酷寒)이 엄습하고 있다. 바이오·제약 등 분야를 막론하고 후속 투자유치 실패담과 거래소 상장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포기했다는 비보가 끊이지 않게 들려온다. 그나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기업은 주목이라도 받으니 처지가 낫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소리소문없이 사업을 접는 곳도 있다.
헬스케어 업계의 자금 경색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바이오·의료 분야 신규 투자는 675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066억원 대비 16%나 감소했다. 3분기까지 집계하면 낙폭은 27%로 늘어난다. 늘어도 시원찮을 판에 급격히 줄었다.
바이오·제약을 중심으로 한 헬스케어 산업은 상품 개발 기간이 길고 실패 확률이 높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수명이 늘어나고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는 인구가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과 그동안 정복하지 못한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희망을 동력 삼아 성장해 왔다.
국가 차원에서도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은 충분하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보건 산업을 국가 안보와 주권 확보 차원으로 접근하는 인식의 토대가 형성됐다.
2007년 세계 19위에 불과하던 우리나라의 임상시험 규모가 2021년 6위까지 성장한 데는 이 같은 배경에서 민·관이 합심한 덕이다. 다만 경제 위기가 닥친 지금은 앞에서 언급한 약점 때문에 민간 투자에서 후순위로 밀려났을 뿐이다.
대내외 환경이 나쁘다고 헬스케어 산업을 돌보지 않기에는 그 손실이 너무 크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지금 이순간에도 자국의 헬스케어 산업 경쟁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미국이 '바이오 이니셔티브'를 주창하며 의약품을 비롯한 바이오 산업 중심을 자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지금 산업이 1~2년 위축된다면 10년 후 격차는 5~6년으로 벌어질 수 있다. 유망한 기업들은 지금도 해외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풍부한 자금이 있는 곳에서 사업을 전개하려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지금 업계에는 '옥석가리기'가 아니라 토양 자체가 망가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위기를 헤쳐 나갈 방법은 분명하다. 곳간에서 인심이 나는 법이다. 민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기업이 어려운 기업을 이끌어야 한다. 성장 가능성이 엿보이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면 나중에 큰 성과로 돌아올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대기업 중심으로 스타트업과 손잡는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이 활성화되고 있다.
정부는 뚝심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1조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100억원 설정했다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400억원으로 증액해서 국회에 제출했다. 결과적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정부 지원이 안정적으로 계속될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정부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민간 투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