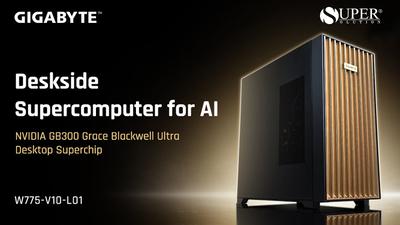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청한 총 9500억원 규모의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이 첫 관문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각국이 통신위성 발사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우리만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커버리지가 넓은 위성통신은 자율주행자동차,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선박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필수 인프라로 꼽힌다. 5세대(5G) 통신에 이은 6G 통신의 핵심이다. 이 때문에 해외 각국은 위성 발사 경쟁에 들어갔다. 중국은 저궤도 통신위성 1만2992기 발사 계획을 수립했다. 미국도 민간기업 스페이스엑스를 중심으로 오는 2025년까지 1만2000여기의 통신위성을 쏘아 올린다는 계획이다. 영국과 캐나다도 각각 5260기, 1700기를 발사하기로 결정하고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주파수를 신청했다. 반면에 한국은 예타 조사가 좌절되면서 계획이 전무한 실정이다.
위성통신이 주목받는 이유는 넓은 커버리지 때문이다. 천문학적인 비용 때문에 기지국을 세우지 못하는 산, 바다, 오지를 커버할 수 있다. 현재 5G 네트워크까지 구축한 우리나라 통신 커버리지는 전체 국토의 37%에 불과하다. 통신 음영지역 때문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UAM이나 자율주행선박 등을 운영할 수 없다.
이번 예타에선 위성통신의 경제성 문제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각국이 구축한 통신을 이용하면 훨씬 저렴하다는 논리다.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예산 당국으로선 충분히 고려할 만한 잣대다.
그런데 이런 경제성 논리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도 발사할 필요가 없다. 미국 스페이스엑스와 같은 기업에 위탁하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발사체를 쏘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위성통신 산업은 2040년에 700조원대로의 급성장이 예상된다. 한국은 발사체에선 다소 뒤졌지만 위성 개발력에선 세계 정상급이다. 위성에 들어가는 수많은 부품과 장비를 개발할 능력을 보유했다. 그러나 통신위성을 독자의 능력으로 쏘아 올린 레퍼런스가 없다 보니 해외 기업에 납품하기가 쉽지 않다. 통신위성 발사 국책사업은 이런 부품·장비 생태계 활성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또 기술 독립 문제다. 과기정통부가 예타 재신청에 나선다고 하니 예산 당국이 좀 더 넓은 시야로 국익을 보고 판단하길 바란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