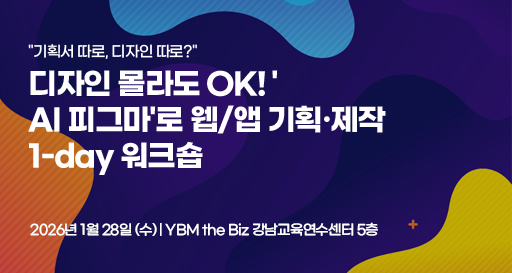누가 힘든지 딸과 논쟁했다. 나는 회사생활이 힘들다 했고 딸은 학교생활이 힘들다 했다. 딸의 한마디에 KO패했다. “그래도 아빠는 돈이라도 받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렇다. 회사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집을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은행에 돈을 맡기면 크든 작든 소득이 생긴다. 우리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나라가 외침을 막고, 치안을 유지하고, 다툼을 중재하고, 약자를 돌보는 등 공적 서비스를 대신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세금으로 걷는다. 그것이 국가와 국민 간 법적 약속이다.
유럽에선 부자로부터 돈을 걷기 위해 고급주택 창문에 세금을 매기고, 국민건강을 위해 식품에 설탕세 등을 부과했지만 실패했다. 창문을 없애고, 이웃 나라에서 식품을 구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득세와 부가세는 자본주의 산업사회 성장 과정에서 합리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다.

데이터·인공지능(AI)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이 속도를 내고, 디지털경제가 오프라인 경제를 대체하고 있다. 정보통신·과학기술 혁신이 스마트폰, 디지털 플랫폼,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등 각종 요소와 융·복합해서 정치·경제·사회 전반에서 삶의 구조를 바꾸고 있다. 첨단 분야의 고급 일자리가 늘고 있지만 단순·반복 업무를 필두로 많은 일자리가 줄고 있다. 혈연·학연·지연 등 출발선이 다른 경쟁은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AI 시대 일자리 감소와 줄어든 일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경쟁이 공정하지 못하고 구조적이라면 그 피해가 정당화될 수 없다. AI 산업화가 국가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과 집중이라면 일자리를 잃은 국민에게 스스로 피해를 떠안으라고 요구할 수 없다. 과거 영국 산업혁명 당시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뺏은 기계를 파괴하는 운동을 벌였지만 억압받았다. 그러나 지금은 인간 존중의 시대다.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억누를 수 없다. 공존의 가치를 찾아야 한다.
AI가 촉발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세금·소득 제도에 대한 해묵은 상처와 고민을 다시 들춰낸다. AI 등 혁신산업에 세금을 부과하고, 그렇게 해서 거둔 세금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을 돕거나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어떨까 하는 논의가 그것이다.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은 전 세계 고객 대상으로 온라인 사업을 하지만 나라마다 사업장을 두진 않는다. 법인세가 낮은 국가에 사업장을 두고 거기서만 세금을 낸다. 그러니 제조업체에 비해 법인세 등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이 때문에 유럽을 필두로 글로벌 IT 기업으로부터 법인세와 별도로 디지털세를 받아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고, 설득력을 얻고 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는 로봇세를 꺼냈다. 로봇이 일자리를 뺏으니 세금을 걷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을 돕자는 것이다. 로봇을 AI로 바꾸면 AI세가 된다. 데이터세 이야기도 나온다. 데이터에 저작권 등 권리가 붙어 있으면 돈을 주고 쓰지만 개인정보 같은 데이터는 수집·이용 동의만 받고 그냥 쓴다. 데이터 같은 외부자원을 공짜로 쓰는 기업에 세금을 물리자는 것이다.
기본소득 주장은 국가가 국민에게 노동·구직 활동을 하지 않아도 정기적인 봉급을 주자는 것이다. 필요한 돈은 국가사업 이익, 기금이나 세금으로 충당한다. AI 등 혁신기업은 데이터 및 AI 자기 학습을 위해 외부자원 의존도가 높다. 국민 다수가 일자리를 잃고 소비를 줄인다면 AI 등 혁신기업 피해도 난다. 그래서 AI 등 혁신기업의 이익을 세금으로 걷어서 기본소득 재원으로 하는 방안이 이야기된다.
혁신 '결과'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정당할 수 있다. 그러나 혁신 '과정'에 세금을 매기면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프랑스혁명 당시 마리 앙투아네트는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군중에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고 했다. AI세 등 신규 세제와 기본소득 논의를 AI 시대의 새로운 역사로 만들지 역사 속의 '케이크'로 남길지 깊은 고민과 선택이 필요하다.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국가지식재산위원) sangjik.lee@bk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