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교과 과정이 종종 바뀌어 왔다. 그런 탓에 세대를 나누는 구분이 되기도 한다. 한때는 명제란 단원이 있었다. 어찌 보면 참과 거짓을 판정하면 되니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여러 명제가 괄호와 논리 연산으로 묶여 합성 명제가 되면 얘기는 달라진다. 종종 한 줄을 넘기는 긴 명제에는 웬만큼 집중하지 않으면 어딘가 실수하게 된다.
경영은 매번 판단의 묶음이다. 물론 매번 참, 거짓을 판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은 피하고 그럴듯한 대안을 택해야 한다.
사실 대안 탐색은 두 가지 질문에서 시작된다. 하나는 “지금 닥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서 시작된다. 이것은 종종 '문제 탐색'으로 불린다. 두 번째는 “어떻게 지금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둘까”에서 시작하는 탐색이다. 물론 투자를 더 해야 성과를 높일 수 있다. 결과부터 말하면 경영은 질문에서 시작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 때문에 많은 경영 구루는 바른 질문을 찾는다. “우리의 고객은 누구인가” “고객은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는 그런 공통된 논제이자 질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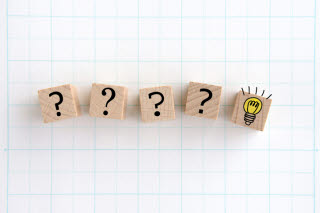
백인백색이겠지만 혁신에도 다음과 같은 질문들은 있다. 그 가운데 “소비자가 해결하려고 애쓰는 문제는 무엇입니까”라는 물음은 고전이다. 물론 질문의 의도는 얼마든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고객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과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비고객을 들여다보는 것은 다르다. 소니가 자신의 전자책(e북) 고객에게서 들은 답과 아마존이 비소비자에게서 들은 답이 달랐다. 물론 아마존은 킨들이란 더 나은 답을 찾았지만 아무튼 이 질문에서 대안 찾기가 시작된 셈이다.
두 번째는 “버려진 소비자는 없는가”라는 물음을 꼽는다. 상식이 부족하든 독특한 습관 탓이든 값이 너무 비싼 탓이든 기존 제품을 사용할 수 없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질문은 유효하다. 게다가 이건 혁신을 위한 좋은 통로가 된다. 기업들과 경쟁하는 대신 이른바 '비소비자'를 찾아 나서라는 주문도 여기서 찾은 답이다.
세 번째는 “'또는' 대신 '그리고'로 찾는 대안은 없을까”란 질문이다. 성능과 가격을 놓고 보자. 이것은 '또는'이란 논리기호가 붙는다. 더 나은 성능이라면 더 많이 지불해야 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더 나은 제품을 원한다는 소비자의 중얼거림이 정작은 내게 적당한 성능과 가격이란 고백이라면 어떻게 할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에 어느 기업의 새 광고가 나온다. 보장이란 의미의 '어슈어런스'란 타이틀이 붙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만일 당신이 갑자기 직장을 잃으면 구입한 차를 돌려주면 된다는 내용이었다.
이 광고에 비친 소비자는 지쳐 보였고, 불안함이 느껴졌다. 자기 고객에게 모든 것을 미루는 대신 책임져야 할 짐을 함께 지겠다는 메시지였다. 결과는 충분한 보답으로 돌아왔다. 이듬해 자동차 판매는 20% 넘게 는 것으로 기억한다. 거기다 정작 돌려받은 자동차는 350대밖에 안 됐다.
기업이 바라는 더 나은 답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당장 내려야 할 논리 명제로 본다면 참과 거짓으로 나눌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질문에서 시작한다면 어떨까. 다른 결론에 이를 수도 있지 않을까. 정작 우리가 꿈꾸는 '1+1=3'도 실상은 거짓 명제이지 않은가.

박재민 건국대 기술경영학과 교수 jpark@konkuk.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