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 책을 뒤적거리다 보면 흔치 않은 용어를 만나기 일쑤다. 전능, 만능, 다능 같은 단어도 그렇다. 물론 영어 단어에서 유래된 번역어이다. 여기서 '능하다'는 반복되니 결국 의미 차이는 앞머리 뜻 차이겠다. 세 용어의 앞머리는 토티(toti-), 플루어리(pluri-), 멀티(multi-)이다.
세포를 예를 들어 구분해 보면 전능이란 신체의 모든 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만능도 비슷하지만 만능한 자기 자신을 만들 수는 없다. 곧 만능은 전능에서만 나온다. 다능은 만능만 못하다. 하나 이상의 기능은 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정해진 기능으로 제한된다.
모든 기업은 언젠가 초짜이었기 마련이다. 물론 처음 시작할 때 분명 그랬다. 그렇다고 단 한 번만 그런 것은 아니다. 만일 그랬다면 그 기업은 이미 사라졌거나 곧 꺼질 등잔불 같은 신세다.
기업은 성장하며, 여러 번 초짜 시절을 거친다. 아무리 제 영역 안에서 큰소리치던 기업도 다른 누군가가 단단히 수성하고 있는 시장을 노려야 한다면 기꺼이 초짜 모양을 자처해야 한다. 이전에 없던 새 시장을 만들고자 한다면 이 초짜는 개척자이기도 하다.
그러니 이들이 노릴 만한 것은 대개 두 가지다. 물론 애플처럼 어느 날 시장에 떡하니 나타나 스마트폰이란 요술봉을 휘두르며 휘어잡는 예외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품질이나 기술 요구가 그만그만하고, 굳이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저가 시장이나 틈새시장 또는 버려져 있거나 아무도 가 본 적 없는 새 시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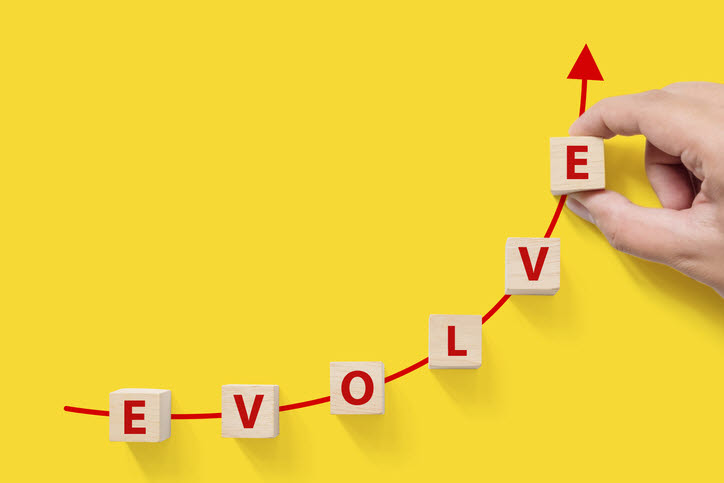
공교롭게 이 두 공간은 기존 기업이 간과하는 곳이기도 한다. 수성 기업들은 고수익을 안기는 기존 고객에 안주하기 십상이다. 물론 틈틈이 저가 시장을 탐색하기도 하고 성벽 넘어 정찰하러 다니지만 특별한 위험 징후가 없다면 차츰 뜸해지기 마련이다.
그러니 이들 초짜가 노려야 할 것은 우선 발 디디고 설 만한 발판이다. 발판이라 하면 전문용어하곤 거리 먼 단어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 엄연히 풋홀즈란 단어로 자주 쓰인다. 실상 초짜의 시장 전략 묘사에 이만큼 적절한 단어도 없는 탓이다.
그럼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학자들 제안은 제법 세포생물학을 닮았다. 첫 조언은 진화하란 것이다. 어떤 세포는 맡겨진 역할을 따라 하는 대신 새 역할을 찾아 나서는 것처럼 지금 제품이나 서비스에 고착돼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진화 과정을 기꺼이 거치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혁신이 처음부터 시장을 뒤바꾼 것은 아니다.
노트북이 처음 나왔을 때 데스크톱을 하루아침에 밀어낸 것은 아니었다. 데스크톱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잠깐을 대신하는 보조 역할이었다. 성능을 충분히 높이고서야 지금처럼 주인장 행세를 할 수 있었다.
거기다 이런 초짜들의 성공이 마치 렌털 모델이 어느 순간 신장개업 인사에 끼는 전단지처럼, 여느 신참 기업에도 전가의 보도가 된 것처럼 자주 기존 기업들과 다른 비즈니스 모델에서 왔다는 점도 기억해 둘 거리다.
1977년에 출시된 '애플Ⅰ'이 실패작이었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정작 애플은 초기 사용자들 손에 무언가를 재빨리 쥐여 줬고,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고 원하지 않는지를 배웠다. '애플Ⅱ' 출시는 성공을 거뒀고, 소비자의 기대를 넘어선다는 애플 명성은 이렇게 시작됐다.

박재민 건국대 기술경영학과 교수 jpark@konkuk.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