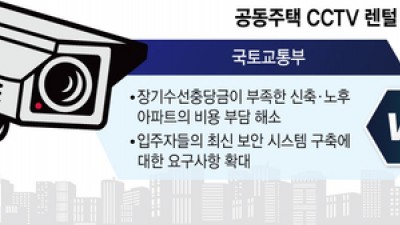게임 산업은 상위 업체만 놓고 보면 화려하기 그지없지만 양극화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3N(넥슨·엔씨소프트·넷마블) 시가 총액은 53조원이다. 상위 10개 업체로 범위를 늘리면 63조원이 넘는다. 나머지 30개 업체가 5조원가량을 차지한다.
매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3N 매출 총합은 6조5600억원에 이른다. 차순위 업체인 NHN, 펄어비스, 네오위즈, 게임빌, 컴투스, 웹젠, 위메이드, 조이시티, 선데이토즈와 지난해 돌풍을 일으켰던 플레이위드, 미스터블루 작년 매출까지 합쳐도 3N 매출 34%(2조2600억원)에 불과하다. 현재 모바일 게임시장 매출 1위 '리니지2M'이 지난해 말에 출시돼 3N 매출에 제대로 잡히지 않았음에도 큰 격차를 보인다.
상장사가 아닌 전체 업체로 범위를 늘려보면 더욱 심각하다. 2018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국내 게임업체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게임사 평균 연매출은 167억원이다. 중앙값은 6억원이며 10억원 미만 매출을 기록한 업체는 전체 58.7%다. 2018년 3N은 6조2000억원을 벌었다.
더 큰 문제는 중견기업 내에서도 양극화 조짐을 보인다는 점이다. 게임 흥행으로 탄탄한 성장을 이어가거나 새로운 먹거리 발굴로 반전에 성공하는 게임사가 있는가 하면 신작 출시 지연, 흥행 부진으로 장기 침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임사도 있다. 허리 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면서 허리가 무너졌다.
모바일 게임시장이 대규모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로 재편된 후 국내 시장이 MMORPG를 만들 수 있는 게임사와 그렇지 않은 게임사로 나뉜 탓이다. NHN, 선데이토즈, 더블유게임즈, 미투온, 데브시스터즈 정도만이 MMORPG 없이 성장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정도다.
신작으로 돌파구를 열어 보려고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인기 지식재산권(IP)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IP없이 모객을 하기에는 이용자유입비용(UAC)이 부담스런 수준이 됐다.
어설픈 투자금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에 투자자는 안정적인 회수가 가능한 산업으로 떠났다. 초기 투자가 메말랐고 연구개발 부진은 신작 부재로 이어졌다. 이는 다시 실적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밀물처럼 들어오는 중국게임에 안방까지 내줬다.
한 번의 신작 흥행 실패가 치명타가 된 까닭에 게임 생태계 기반이 돼야 할 중소기업이 쓰러졌다. 2012년 1만6000개에 달하던 사업체 수는 2018년 880개로 줄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