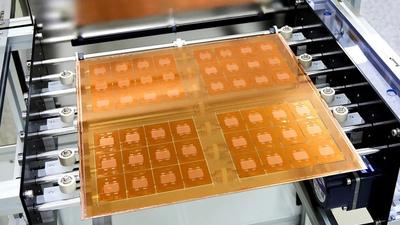국내 의료계의 해묵은 논쟁 '원격의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21일 정부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의심환자의 의료기관 직접 방문으로 인한 감염 차단을 위해 '전화상담'으로 약을 처방받도록 허용하면서부터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전화상담'이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의료계와 제대로 된 협의도 하지 않았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사실 전염병이 촉발한 '원격의료' 허용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으로 인해 삼성서울병원이 부분폐쇄 조치가 되자 원격의료를 한시 허용하기로 했다. 해당 병원에 다니는 기존 환자 보호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당시에도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 안정성과 유효성 검증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지금은 메르스 상황과 많이 다르다. 감염병 위기 단계인 '주의'에 머무른 당시와 달리 현재는 대구·경북 지역 바이러스 확산과 함께 '심각'의 최고단계로 올렸다. 게다가 이들 지역은 음압병실 등 격리병동 수용 능력 한계까지 이르고 있다. 호흡기 질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의 병원 내 감염도 우려된다.
5년 전과 달리 통신 인프라는 더 빨라졌고 모바일은 우리가 생각을 뛰어넘을 정도로 발전했다. 안정성과 유효성을 논하기에는 이미 미국, 일본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조차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있을 정도로 늦었다. 규제로 막고 있는 나라를 찾아보기는 더 어렵다.
물론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것은 '코로나19'라는 한정된 기간·상황에서만 유효하다. 그러나 원격의료 논란이 의료단체와 정부의 불협화음 정도로 끝나선 안 된다.
국가 위기 사태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을 경험했다. 선진 의료기술, 5세대(5G) 이동통신, 인터넷 인프라 등 고도화된 기술도 '규제'가 막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된 후 가장 먼저 '원격의료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논의를 구체화해야 한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