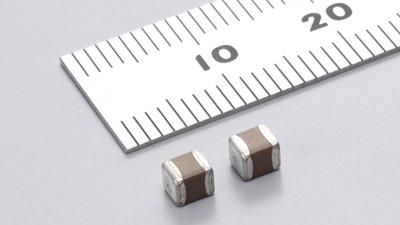'모빌리티(Mobility)'란 무엇일까. 우리말로는 '이동 또는 이동성'이다. 여기서 이동이라는 의미는 출발지와 목적지가 있는 상태에서 출발지를 떠나 목적지에 도달하는 행위를 뜻하기 때문에 레저용이나 놀이용과는 구분되는 단어다. 이러한 '이동'과 관련해 과거에는 더 먼 거리를 더욱 빠르게 이동하는 이동수단 중심의 경쟁이었다면 향후 미래에는 더욱 편리하고 수준 높게 이동하는 질적 목표를 중심으로 이동성이 중요해질 것이다. 이러한 이동성에는 많은 종류의 이동수단이 필요하다.
요즘 '스마트 모빌리티' 'e-모빌리티'라는 말을 처음 들어 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e-모빌리티를 접해 보거나 알고 있다. 국내 e-모빌리티 시장은 2018년 기준약 14만5000대, 1700억원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2017년 8만7000대에 비하면 2배 이상 시장 규모가 성장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느끼는 편의성, 가격 대비 성능(가성비),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시장도 급격하게 성장하는 반면에 아직도 법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표 사례로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사용자의 경우 이륜자동차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따야 하고, 안전보호 장구를 의무로 착용해야 하며, 도로 운행 시 자전거도로가 아닌 일반차도로 주행해야 한다는 규정 등이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해외의 경우 e-모빌리티를 활용한 공유서비스 업체들이 다양한 서비스 모델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몇몇 업체는 유니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법제도와 규제로 인해 비즈니스 모델을 사업화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국내에서는 왜 새로운 이동수단인 e-모빌리티의 활성화 속에서 법제도나 규제가 많이 생겨나게 된 것일까.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로가 자동차만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조성됐기 때문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차도에는 수많은 육교가 설치돼 있었다. 육교는 보행자를 위한 시설물이 아니라 자동차의 교통 흐름 방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지금은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육교 대신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처럼 차량 중심 교통정책에서 보행자 중심 교통정책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지만 새로운 이동수단인 e-모빌리티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책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 기존의 법제도나 규제로 통제하려고 하니 상호 충돌에 의해 새로운 규제가 생기게 된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의 경우 크게 자동차와 보행자로 구분한다. e-모빌리티는 보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차로를 구분해서 운전면허도 있어야 하고, 안전보호 장구도 의무로 착용해야 한다.
'초소형전기차'를 유럽에서는 'L-카테고리'로 구분,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에 가까운 형태의 이동수단으로 정의돼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자동차와 이륜차 구분만 있기 때문에 초소형전기차를 자동차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안전 기준도 마련하였다. 초소형전기차가 안전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금지하는 것 역시 아직까지 우리나라 도로는 자동차만을 위한 전용 공간이라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도로는 공공 시설로서 어느 한 종류의 이동수단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국내에도 다양한 이동수단에 대한 병행 교통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초소형전기차, 이륜자동차,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이 함께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날이 곧 다가올 것을 기대한다.
박영태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회장 ytpark@cammsy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