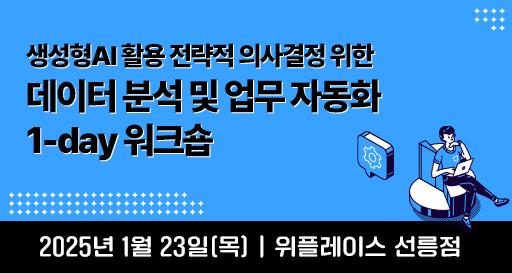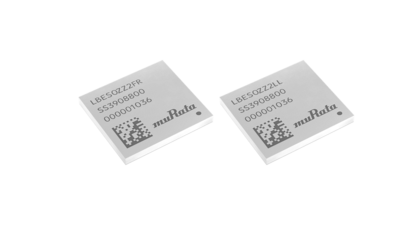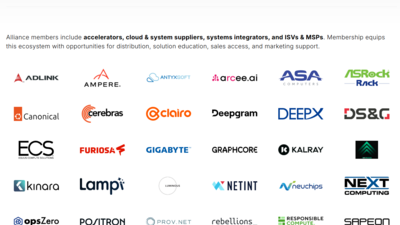온·오프라인에서 활용 가능한 신개념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이 등장한다. 서비스 사용 수수료도 파격적이다. 기존 배달 앱 대비 10분의 1에 불과한 1.5%로 책정됐다.
센시콘(대표 김동국)이 26일 카멜레온 플랫폼을 고도화한다고 밝혔다. 플랫폼은 배달 앱, 포스, 무인 결제시스템(키오스크)으로 구성됐다. 중심은 카멜레온 앱이다. 베타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내달 초 출시한다. 850여 매장이 입점했다. 올해 중 1000곳을 넘길 계획이다.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쓸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집에서는 배달 앱 배달의민족, 요기요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한다. 집 주변 음식점을 연결해준다. 직접 매장을 찾을 때도 유용하다. 앱을 켜면 해당 가게 메뉴판이 뜬다. 원하는 음식을 고른 뒤 결제할 수 있다.
주문·결제 내역은 매장 포스로 자동 넘어간다. 매장 직원은 포스에서 대기시간을 3·5·10·15분 단위로 선택, 고객에게 알려준다. 음식이 완성되면 호출 버튼을 눌러 고객을 부를 수 있다.
블루투스 기술을 적용했다. 스마트폰과 매장에 설치된 블루투스 송·수신기(비콘)가 연결돼 매장관련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는다. 쿠폰도 보낼 수도 있다. 센시콘은 비콘을 자체 개발했다. 80m 범위 안에서 통신이 이뤄진다. 가격은 3만3000원이다.
배달 기능도 추가한다. 주문 중개에 이어 배달 대행 서비스를 내달 말 시작한다. 이를 위해 배달 대행업체 바로고, 스파이더와 손잡았다. 테이크아웃 서비스도 가능하다. 퇴근 후 집에 가는 도중 음식을 찾아갈 수 있다.
파격 수수료를 내세웠다. 음식값의 1.5%로 정했다. 국내외 배달 앱 수수료는 10~30% 사이다. 센시콘은 1.5% 중 0.5%를 리워드 형태 쿠폰으로 지급한다. 실제 고객 부담 수수료는 1% 안팎이다.
카멜레온 키오스크는 지난달 출시했다. 서울 논현동 본사를 포함해 전국에 영업망 32곳을 구축했다. 사후관리서비스(AS)도 한다. 한국사이버결제(NHN KCP)와 생태계 확장에 나섰다. 키오스크에서 나오는 음성은 아이돌 가수 황인선씨 목소리다.
카멜레온 미니포스도 선보였다. 앱, 키오스크와 연동한다. 배달 주문, 결제, 배달 작업이 한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되는 것이다. 국내 최초 사례다. 푸드테크, KT 스마트로가 만든 포스와도 연동할 수 있다.
정교한 상권 분석이 가능해졌다. 메뉴·고객별 주문량을 파악할 수 있다. 마케팅 정책을 설계하는 데 유리하다. 기존에는 메뉴 하나를 바꿀 때도 앱과 키오스크, 포스 정보를 모두 수정해야 했다. 결산 시에도 세 곳에서 일어난 매출을 일일이 집계, 더해야만 하루치 수익을 알 수 있었다.
센시콘은 2016년 8월 문 열었다. 주유소를 거점으로 한 배송 시스템을 도입, 요식업을 넘어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거듭날 목표다.

◇인터뷰-김동국 센시콘 대표
“배달 수수료 1.5%면 충분합니다.”
김동국 대표는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를 낮췄다”면서 “수익 구조 다변화를 통해 매출을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당분간 주문 중개 수수료는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익 대부분은 키오스크 및 무인화 솔루션 판매로 발생한다.
김 대표가 배달 앱 사업에 뛰어든 데는 부모 영향이 컸다. 아버지, 어머니는 40년 넘게 분식점을 운영했다. 아버지는 팔순이 될 때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가게 문을 열었다. 자식들 결혼식 날조차 오후에는 장사를 했다.
김 대표는 아버지와 같은 길을 갈 자신이 없었다. 365일 내내 손님을 받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대신 “내가 가게에 없어도 단골손님이 나를 기억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 같은 고민에서 배달 앱과 비콘을 개발했다.
김 대표는 실패의 쓴맛을 본 적이 있다. 이러닝 콘텐츠 분야에 도전장을 냈다. 하지만 기득권 벽에 부딪혀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는 향후 목표에 대해 “아마존처럼 무인 매장 사업에 나설 것”이라며 “이미 카메라 트래킹 기술을 개발, 특허를 출원했다”고 전했다.
해외진출 계획에 대해서는 “베트남, 일본 현지 업체와 구체적 대화가 오가고 있다”며 “미국, 중국 시장에도 진출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