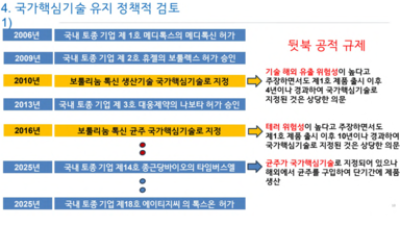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중국발 ‘인재유출 비상령’이 다시 불거졌다. 연구원, 퇴직 임원에서 현직 고위임원까지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인재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경을 넘나들며 지키고 뺏으려는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내 대기업 소프트웨어(SW) 분야 최고위급 임원 A씨는 중국 통신기기 제조사로부터 이직을 제의받았다. 협상을 놓고 고민하던 때 정보를 입수한 현 직장 최고책임자의 설득으로 무마됐지만 업계에서는 A씨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굴지 대기업의 현업 관리직까지 중국발 인재 영입 시도가 더욱 적극 이뤄진 특이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회사 사정에 밝은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퇴직 임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던 한국 인재 영입 대상이 현직 최고경영자까지 확대됐다는 걸 보여 준 사건”이라면서 “퇴직 후 고문직도 포기하고 이직을 고민했을 정도로 중국 측에서 내건 조건이 상당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통신 분야 SW 노하우가 상당한 A씨가 중국으로 넘어갔다면 국내 업계의 타격이 컸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대기업은 중간직 이탈이 매월 진행돼 대책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구글과 애플에서 마케팅, 엔지니어 가릴 것 없이 국내 인력에게 적극 손을 내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 직원은 “최근 들어 사무실 책상 주인이 자주 바뀌고 있다”면서 “구글, 애플에서 30대 중·후반 직원에게 이직을 적극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ICT 업계에 인재 유출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 반도체 업계뿐만 아니라 SW 분야는 물론 국적, 직책 가릴 것 없이 전방위적이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동종 업계 이직금지’ ‘퇴직 후 수년 간 고문대우’와 같은 안전장치는 기능을 잃었다. 거주, 숙식, 복지, 교육 등 파격 조건을 받아들이고 해당 국가로 떠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하드웨어(HW)와 달리 SW는 ‘인력이 곧 경쟁력’이다. 노하우는 대부분 우수 인재의 머리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인재 확보 경쟁은 기업 생존의 바로미터로 떠올랐다. 삼성은 이병철 창업주, 이건희 회장으로 이어진 ‘인재양성’ 철학을 바탕으로 국적·성별·직종을 불문하고 능력이 검증되면 영입한다.
LG반도체 출신 전영현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장(사장), 미국 바이오 업체 다이액스 출신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사장)가 대표적이다. 코카콜라에서 근무한 피오 슝커 전무는 지난해부터 삼성전자 미국 스마트폰 마케팅을 이끌고 있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중국 화웨이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출신 김준서씨를 모바일디자인팀 총괄사장으로 영입한 후 스마트폰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 중국 스마트폰 시장 1위를 거머쥐었다. SK하이닉스는 2014년부터 삼성전자 출신 인사를 고위직으로 영입,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전자업계 전문가는 “지난해 중국 국영기업 칭화유니그룹의 미국 샌디스크 우회 인수 시도는 인재 확보로 경쟁력을 따라잡겠다는 중국의 전략을 보여 준 사례”라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발광다이오드(LED) 등 첨단 제조업뿐만 아니라 무형 자산 또한 인력 유출은 치명타”라고 우려했다.
서형석기자 hsse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