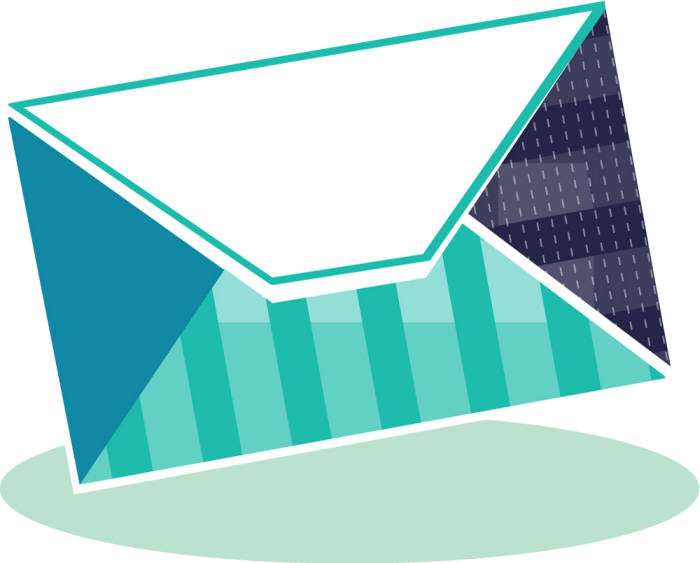

“원자력은 화장실과 같습니다. 혐오시설이긴 하지만 꼭 필요하죠. 하지만 어떻게 화장실은 뒷간에서 안방까지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울진에서 A씨가 보내온 편지는 이런 물음으로 시작됐다. 자신을 울진에서 나고 자란 그는 학생시절 원자력동아리 활동을 했고, 지금은 어엿한 성인이 돼 지역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원전소재지에서 원전을 둘러싼 갈등을 지켜봐 온 그가 내놓은 갈등 해법은 ‘다수간 대화를 통한 대중적 수용’이다.

원전 주변 지역민의 원전 수용성을 높이려면 정확한 정보와 대화, 그리고 국민적 관심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사회가 풍요로워진 만큼 개인의 자유와 안전이 중요시되고 국민알권리와 정책에 대한 동의는 이제 당연한 요구사항이 됐다. 사회단체의 정당한 반(反) 원전활동이 보장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A씨는 지금까지 원전 기관이 지역 수용성을 위해 벌여온 소통 노력은 부족했고, 만족도가 낮다고 평가했다. 소통 노력이 원전 대중화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단지 일부 이슈에 대한 수용성 확보와 지지획득 도구로 대상화됐다고 평했다. 대화와 토론이 전문가 중심의 고차원적 정보로 매번 특정 계층에서만 맴돌고 있다는 지적도 빠뜨리지 않았다. 이런 과정이 오히려 불신을 높이고,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이슈에는 반 원전 정서가 확산되는 한 원인이 될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A씨가 제안한 대안은 시간과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더라도 일반인도 함께 할 수 있는 대화와 토론을 통한 대중화다. 아직도 수많은 이들이 원전에 대해선 어려운 기술, 위험한 것 등으로 인식하지만, 이를 알려고 나서지는 않는다. 물론 정책 결정에 지연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른 관련 산업 성장 둔화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런 노력까지 감수해야 대중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화장실이 뒷간에서 안방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 그런 문화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며 “아직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원전에 대한 권위주의적 정책, 불투명성, 소수의 정보 독점과 같은 인식을 깨뜨리고, 대중화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