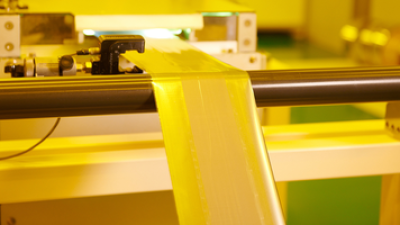모바일게임 ‘단명’은 옛말이다. 출시 후 2년이 넘게 매출 상위권을 유지하는 게임들이 나타나며 장수시대를 열었다.
4일 구글플레이에 따르면 ‘세븐나이츠’가 새해 매출 1위를 기록했다. 넷마블게임즈가 2014년 3월 출시한 이 게임은 햇수로 3년째 10위권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1월 현재 구글플레이 상위 10위권 중 6개 게임이 지난해 시장에 나온 ‘신상품’이다. 세븐나이츠를 비롯해 ‘모두의 마블’ ‘클래시오브클랜’ ‘몬스터길들이기’ 등 4개 게임이 2013·2014년 출시작이다.
김윤상 게임넥스트웍스 대표는 “시장에 안착한 온라인게임보다 수명은 짧지만 상위권에서 롱런하는 게임이 늘고 있다”며 “후발주자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상위권에 게임을 올려놓은 회사는 제품 수명을 늘리는 데 집중한다. 구글플레이 기준 매출 상위 5위권은 게임별로 연간 1000억원 이상 매출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넷마블게임즈는 상품별로 ‘제품생애주기(PLC, Product Lifecycle)’시스템을 수립해 운영한다. 서비스 지표가 하락하는 시점에 맞춰 이벤트와 콘텐츠를 업그레이드한다.
모바일게임 서비스 주기가 늘어난 데 따른 부작용도 나타났다. 1월 1위를 차지한 세븐나이츠는 12월 ‘무과금 운동’ 논란을 겪었다.
잦은 업데이트로 캐릭터 성장 법칙이 깨지는 등 게임 밸런스가 무너졌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세븐나이츠는 이 논란 직후 1~2위를 기록하며 매출 최상위권에 올랐다.
게임사 관계자는 “무과금 운동 이후 오히려 해당 게임 매출이 늘었다는 것은 결국 이용자가 쉽게 게임을 놓지 못한다는 증거”며 “오래 운영한 게임은 매출과 함께 이용자 불만이 자라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자가 게임에 투자한 시간과 돈이 늘어난다. 게임사는 각종 리스크에 대비해 운영을 정교히 해야 하는 과제가 증가한다.
신작게임이나 마케팅 자금이 부족한 중소업체 게임에 돌아갈 기회가 줄어든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구글플레이 매출 상위 10위권에 새로 진입한 게임은 대부분 ‘제작비 100억원, 마케팅비 100억원’을 투입한 소위 대작이다.
한 외국계 모바일게임사 관계자는 “한국 모바일게임 마케팅 규모가 1~2년 사이 급격히 커지며 해외기업 기대치가 예전만 못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비용 대비 효과를 누리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김 대표는 “한국 게임 포트폴리오 다양성 부족은 구글, 애플, 카카오 같은 플랫폼사 공통 고민”이라며 “자칫 국내 모바일 게임시장이 갈라파고스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