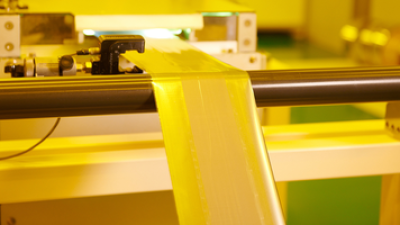마치 어제처럼 머리와 가슴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는 시절의 향기가 있다. 1980년대 도시 곳곳에는 ‘레코드숍’이 있었다. 음악을 좋아했던 사람이라면 박식한 주인장이 전하는 음악 지식과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 시절 레코드숍은 미지의 영역에 자리한 다채로운 꿈이 생생히 숨 쉬는 공간이었다. 어떤 걸 물어봐도 척척 대답해주던 놀라울 정도로 많은 걸 알고 있던 사장님은 아름다운 이상향으로 통하는 입구를 지키는 문지기, 안내자였다.
음악을 고르는 과정은 치열한 고민의 연속이다. 용돈의 한계를 아쉬워하며 앨범을 들었다 놓았다 수없이 반복하고는 한두 장을 고른다. 집에 돌아와 신성한 의식처럼 재킷 포장을 벗기면 검은 LP판 특유의 짜릿한 플라스틱 냄새와 함께 주인을 새로운 세계로 이끌 준비를 마친다.
팍팍한 일상 속 ‘다른 세계로의 여행’인 이 비현실적 상황은 세상의 변화와 함께 사라지고 말았다. 듣고 싶은 한 곡의 음악을 위해 음악감상실로 발걸음을 옮기고 라디오에 신청 엽서를 보내고 ‘빽판’ 가게를 뒤지는 일은 추억이 됐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음악을 듣기 위해 불편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어졌다. 라디오에 신청한 노래가 언제 나올까 매일 밤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테이프에 녹음하기 위해 준비하던 시절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마냥 행복했다.
그런데 뭔가 아쉽다. 까만 플라스틱판을 조심스레 꺼내 턴테이블에 놓고 카트리지를 올릴 때 스피커에서 들리는 미세한 마찰음에 이은 음악의 설렘, 앨범 정보가 담긴 라이너노트를 읽는 동안 흐르던 감흥, 내 영혼은 이토록 온전히 그 음악만을 위해 바치는 시간과 관심과 노력에 비례해 풍요로웠다.
편리하고 쉬운 음악 듣기에 익숙해진 지금은 좋다고 느끼는 음악도 그 편의성 만큼 내게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졌다. 모든 것이 빠르고 복잡해진 때에 앨범 한 장을 제대로 듣고 알기 위해 한 시간을 바치는 건 쉽지 않다.
‘본질’은 변치 않는다. 즐거움과 감동을 준다. 그것이 말초적 자극이든 지적 탐구 또는 허영을 위한 탐미적 만족이든 듣는 이의 감성에 다가와 ‘소리를 통한 즐거움’을 전한다.
음악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늘 머리와 가슴을 떠나지 않는 건 ‘본질’을 대하는 자세다. 음악이 시각적 자극의 충족을 위한 부속품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고요함에 익숙하지 않은 이에게는 일상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한 장식품이며 삶에 밀착돼 영혼을 살찌우는 동반자가 될 수도 있다.
이태원 음악감상 공간 ‘스트라디움(STRADEUM)’에서 음악의 모습과 가치는 후자에 가깝다. 이곳에서는 노래 한 곡에 가슴이 벅차며 눈가에 맺히는 눈물, 앨범에 담긴 모든 소리가 내 몸과 하나 되는 깊은 몰입과 같은 아름다운 감수성으로 가득하던 시절의 소소하지만 커다란 가치가 존중된다.
스트라디움은 오래 전 순수한 감성에 공감하거나 삶에 있어 음악의 무게가 남다른 이에게 최적의 가치를 전한다. 액세서리처럼 돼버려 잊힌 음악의 본질적 가치, 음악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기쁨과 동경, 그 짜릿하고 아름다운 열망이 넘실댄다. 편안함과 설렘, 호기심과 갈망, 아련한 희망과 같은 ‘음악’을 매개체로 얻을 수 있는 소중함이 스트라디움의 이상향이다. 음악과 소리가 전하는 감동을 느끼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곳, 바로 스트라디움이다.
김경진 아이리버 상무(스트라디움 부관장) kyungjin.kim@strade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