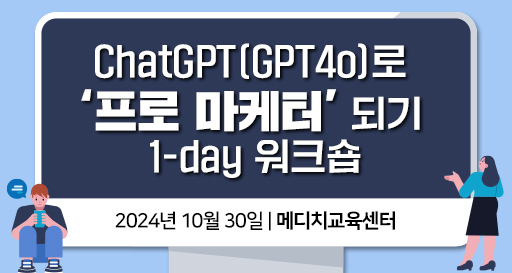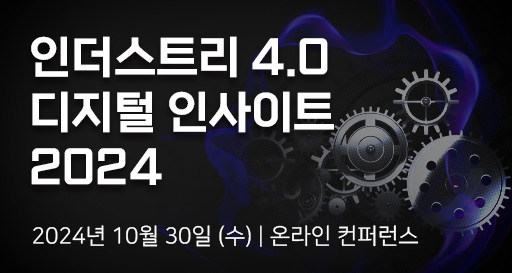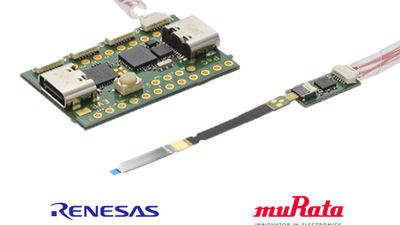미국 공화당 대선주자 경쟁에서 부동산 재벌 출신 도널드 트럼프가 지지율 선두를 고수하며 돌풍을 주도하고 있다.
거침없고 솔직한 그의 발언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하는 정치인을 지켜보는 데 신물이 난 미 유권자를 매혹하고 있다.
미국인은 트럼프의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공세에 시원함을 느끼고 정치도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기대를 품고 있는 듯하다. 트럼프의 거침없는 행보에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지만 정치 역학구도 변화를 원하는 유권자 열망을 트럼프가 반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 언론은 이런 돌풍이 트럼프가 토론이나 연설을 할 때 쉬운 단어를 쓰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보스턴글로브는 트럼프가 초등학교 4학년 수준 언어를 사용해 유권자 마음을 사고 있다고 분석했다. 슬로건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처럼 쉬운 단어를 쓴다. 연설이나 TV 토론 때는 ‘거대한(huge)’ ‘끔찍한(terrible)’ ‘아름다운(beautiful)’ 같은 초급 단어가 눈에 띈다. 정치인을 비판할 때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all talk, no action)”는 식이다.
미 정치인 연설은 점점 간결하고 쉬워지는 추세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의 1796년 ‘고별 연설’은 18학년(대학원2) 수준이었으나,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1863년)’은 11학년(고2) 수준으로 낮아졌다. 존 F 케네디 1961년 시정연설이 14학년(대2) 수준이라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근 시정연설은 8학년(중2)이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다고 한다.
반면에 우리나라 정치인의 말은 너무 어렵다. 논리에 매달려 추상적인 단어를 많이 쓰다 보니 전달력이 떨어진다. 정치인이 일반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자기 말만 하기 급급하다. 우리나라 국민이 정치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정치인이 어려운 말을 써서’라는 지적이 있을 정도다.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3년 연속 시정연설에 나선다. 지난 대통령은 취임 첫해에만 직접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나머지 해는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첫해 시정연설에서 “국회를 존중하기 위해 앞으로 매년 정기국회 때마다 직접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고 있는 셈이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노동개혁 5개 법안 통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관광진흥법 등 국회 계류 경제 활성화 법안 정기국회 내 처리 △11월 중순까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 절차 완료 등에 국회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전달력이다. 시정연설은 행정부 예산안 의회 제출에 즈음해 대통령이 의회에서 행하는 국정 연설이다. 국정 전반에 관한 대통령 생각과 예산편성과 관련된 경제·재정 정책적 사항을 담는다.
시정 연설 대상은 국회뿐 아니라 국민이다. 국민이 시정연설 내용을 잘 이해하고 필요성을 공감한다면 국민은 정부 정책추진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박 대통령이 얼마나 쉬운 연설로 국민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그동안 발언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을 받아온 박 대통령에게 시정연설은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정책팀장=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