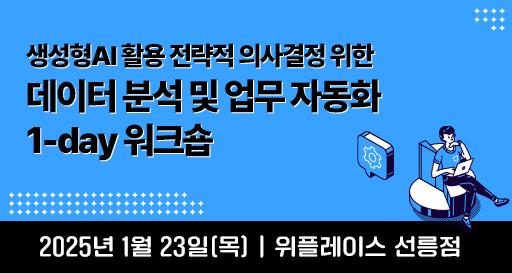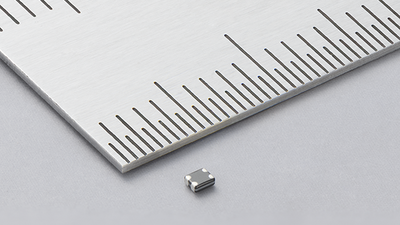최근 여론을 뜨겁게 달군 단어 중 하나가 ‘폐쇄회로TV(CCTV)’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폭력사태를 전국에 생중계한 것도, 대형 화재 원인을 찾아낸 것도 모두 CCTV였다.

CCTV는 특정 수신대상에 영상을 보내는 장치다. 치안과 보안 중요성이 높아지며 산업은 물론이고 가정까지 그 쓰임새가 날로 높아졌다.
CCTV 활용이 빈번해지며 관련 기술도 발전했다.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찍힌 영상을 자유자재로 확대하거나 저장된 DB와 실시간으로 매칭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두운 화면을 밝게 촬영하거나 움직이는 대상을 추적하며 찍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지난해 개봉한 영화 ‘끝까지 간다’에서도 CCTV에 뺑소니 장면이 찍혀 곤경에 빠지는 주인공이 등장한다.
물고기 눈을 닮은 어안렌즈를 활용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밤과 낮 등 조도차를 확인해 어두운 환경에서 밝은 영상을 찍어내는 등 CCTV는 그야말로 디지털 광학의 집합체로 손색이 없다.
CCTV가 ‘눈’이라면 이를 저장하고 효율적으로 분석해내는 ‘머리’ 역할은 소프트웨어의 영역이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한 사람이 CCTV 화면을 20분 이상 보고 있을 때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5%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반복적 업무가 뇌의 효율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것이다.
소프트웨어는 이런 한계를 보완한다. 이른바 ‘지능형 분석’으로 불리는 CCTV 관제기능은 △특정영역에 사람이 침입하는 것을 파악하거나 △누군가 일정시간 이상 한 자리에 머무는 것을 인지하고 △지정한 구역에서 움직이는 사람의 숫자를 파악하는 등 알람과 분석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이런 관제기능을 이용해 매장 내 고객 동선을 파악해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사례도 생겼다. 산불이 일어난 지점을 CCTV로 촬영하는 동시에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제품도 나왔다.
CCTV 확대는 인권문제와도 밀접하다.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감시된다는 것을 반길 사람은 많지 않다.
정부는 이번 인천 어린이집 폭력 사태를 계기로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어린이집 교사 등 이에 반발하는 기류도 만만치 않다.
‘환경 관제’나 ‘치안 확보’ 등 순기능과 별개로 CCTV 본질 중 하나는 모든 대상을 ‘잠재적 범죄’로 분류하는 감시 기능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CCTV 적용은 확대되고 기술도 날로 발전할 것이라는 데 이의를 다는 사람 역시 별로 없다. CCTV 없이 사회 부조리를 견디기에는 그 흉폭함이 임계치를 넘었다. 바야흐로 ‘불신의 시대’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