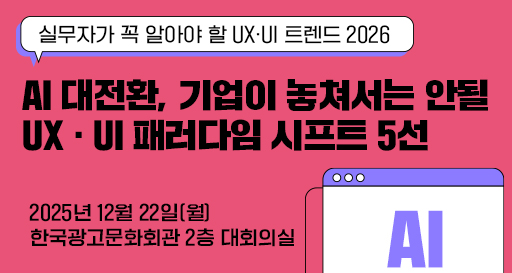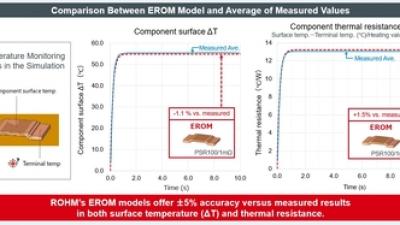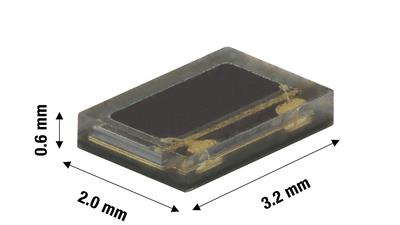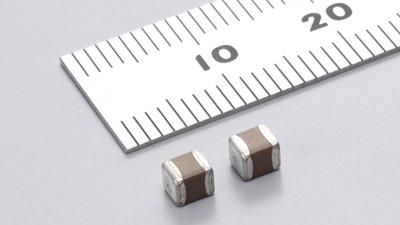구독자수 급감에도 불구, 종이 인쇄만을 고수해온 일본 신문업계가 ‘디지털’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요미우리와 마이니치 신문이 최근 디지털용 뷰어를 내놓으면서, 이제 일본 5대 전국지 모두 기존 종이지면을 PC나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게 됐다.

마이니치는 작년 12월부터 종이신문 가입자에게 무료로 지면 뷰어를 제공중이다. 모든 지역판과 일요판, 석간도 볼 수 있다. 현재 가입자는 38만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종이신문 발행 부수(330만부) 대비 10% 정도에 그치는 수치다. 이 회사 마스다 코우이치 이사는 “올 연말까지 가입자 50만명은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이니치는 이달부터 뷰어에서 ‘주간 이코노미스트’ 등 6개 자매지를 유료 제공한다.
요미우리는 지난 4월부터 지면 뷰어 서비스를 시작했다. 본지 구독자에 한해 유료 디지털 서비스인 ‘요미우리 프리미엄’을 월 150엔(약 1500원)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프리미엄 회원수는 비공개지만, 증가세에 있다는 게 이 회사 후쿠시 치에코 이사의 설명이다.
무료 뉴스 사이트 ‘요미우리 온라인’(YOL)은 월간 페이지뷰가 약 4억건에 달한다. 고정 게시물은 ‘화제’ ‘남여’ ‘어린이’ 등 총 11개 장르에 연간 150만건이 등재되고 있다.
하지만 요미우리는 ‘종이신문 판매 1000만부 달성’이라는 목표를 견지하고 있어, YOL 회원제 도입이나 프리미엄 판매와 같은 온라인 강화책은 당분간 쓰지 않을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2010년 5대 일간지중 최초로 디지털 버전 서비스를 시작, 현재 유료 가입자만 37만명에 달한다.
닛케이 관계자는 “무료 회원을 합치면 240만 명이 닛케이 ID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1년 전부터는 ‘닛케이 MJ’와 ‘닛케이 산업 신문’ 등도 전자뷰어에서 볼 수 있게 제공중이다
올해부터는 TV광고 등을 통해 젊은층 공략에 나서, 신규 유료 가입자중 20~30대의 비중이 5%를 넘었다. 이달부터 새 TV광고를 내보내고, 한달 무료 프로모션 등을 전개한다.
일본 신문 가운데 디지털화에 가장 선행하는 곳은 산케이와 아사히 신문사다.
자회사 ‘산케이디지털’을 지난 2007년부터 일본 마이크로소프트와 공동 운영해 오던 산케이는 지난달말 ‘MSN 산케이 뉴스’ 서비스를 종료, 지난 1일부터 ‘산케이 뉴스’를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새로운 산케이 뉴스는 웹 기사인 ‘산케이 프리미엄’을 확충, 모바일 사진 중심의 ‘산케이 포토’ 등의 코너를 신설했다. 산케이는 또 잡지 미디어와 제휴를 통해 ‘이론나’(iRONNA)라는 종합 오피니언 사이트도 내놨다.
산케이디지털의 콘도 사장은 “종이신문의 디지털화는 PC나 태블릿, 스마트폰 3개 스크린의 화면 크기에 자동 최적화되는 디자인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산케이디지털은 지난 2006년 2월 외부 자본 20%을 포함, 독립 채산 방식으로 디지털 사업을 시작했다. 이 회사의 올 3분기 매출은 39억엔, 순이익 3억엔을 기록했다. 지난 2008년 아이폰 출시 초기부터 서비스해온 산케이 앱의 다운로드 수는 680만건을 돌파했다.
아사히는 미국 소셜 뉴스 미디어인 ‘허핑톤 포스트’와 제휴, 해당 일본판을 지난해 5월부터 서비스중이다. 일본 허핑톤 포스트의 월간 순 방문자 수는 약 1300만명에 달한다. 편집권은 아사히가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본사 격인 아사히신문의 논조나 오보를 비판하는 기사도 여과없이 게재하고 있어 인기다.
아사히신문의 유료 디지털 회원수는 17만명을 넘어섰다. 무료 회원을 합하면 총 회원수는 172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근원적 한계는 여전하다. 노무라 종합 연구소의 미야케 요이치로 수석 컨설턴트는 “디지털 판은 신문의 저변을 넓히는 것은 아니다. 원래 신문을 좋아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들 신문사는 신세대 등 신규 독자층 확보에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리고는 있지만,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대부분은 여전히 중·장년 및 노년층이어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극적 반전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