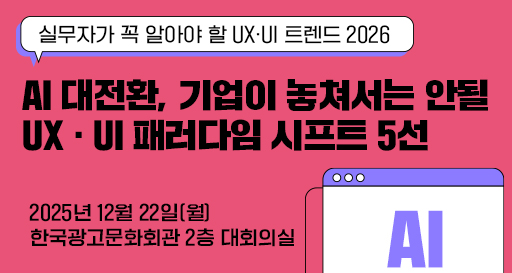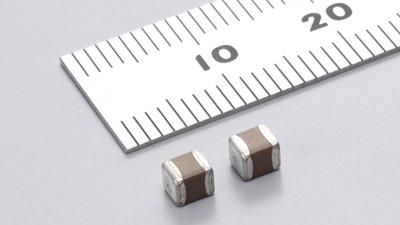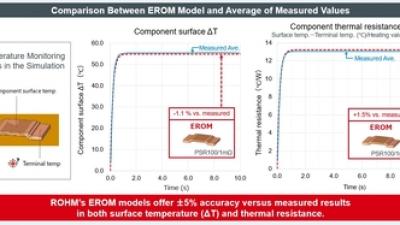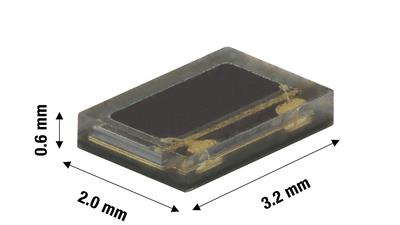이승만 초대 대통령부터 이명박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이끌었던 정부정책의 철학적 기반에는 늘 쇄신과 개혁, 변혁, 혁신 같은 단어가 등장한다. 단어만 다를 뿐 요체는 같다. 변해야 산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에서도 공공기관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내걸고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과학기술계,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노무현정부 때는 박기영 전 대통령과학기술보좌관이 ‘전문연구단위’제를 내놔 큰 관심을 끌었다. 출연연 조직 자체를 혁신형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일몰’이 가능한 연구단위별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이 골자였다.
이명박정부에 와서는 임기철 전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이 임무연계형 출연연 개편안을 내놨다. 임무에 따라 출연연 미션을 나눠보자는 것이다. 큰 틀에서는 ‘전문연구단위’와 유사한 개념이다.
모두 용두사미가 됐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돌고 있다. 전문연구단위와 비슷한 ‘연구실 파산제’ 도입이 그것이다.
‘연구실 파산제’의 출발점은 과제와 연구비가 없는데도 여전히 연구소는 남아있는 데서 출발한다. 과제는 연구원이 멋있는 그림을 그려 따왔지만, 나름의 과제수행은 첫해에 한하며 이후 경쟁력 없는 연구원을 먹여 살리기 위해 과제에 끼워 넣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인사권을 기관장이 쥐고 흔드는 과정에서 부작용도 발생한다. 보직자들은 과제인력을 관리했다는 이유로 논문 저자에 끼워 넣고, 인센티브도 챙긴다.
기관에 임금 총액을 정해주고, 대신 인력충원 등은 기관이 그 범위에서 알아서 하라는 ‘총액임금제’는 형태만 살아있는 시스템이다. 뒤로는 정부가 기관선발 인원을 매년 명확히(?) 몇 명 내에서 뽑으라고 정해주기 때문이다.
출연연은 출연연대로 ‘군살’을 빼야 할 시기에 도달했다. 1980~1990년대 정부 주도로 핵심 연구사업을 수행해 왔으나, 이제는 국가 핵심산업의 주변까지 R&D 영역을 넓혀 놨다.
원자력 분야를 예로 들면, 원자로 개발과 핵재처리 등이 핵심 R&D라 할 수 있다. 굳이 방사선 조사에 따른 식품개발이나 식물 육종 개발을 굳이 국가사업으로 할 필요는 없다.
핵심 연구사업은 국가 R&D 영역으로 담고, 나머지는 연구실 파산제나 전문연구단위 형태로 바꾸자는 것이다.
연구실 파산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연구실 책임자가 인사권을 보유해야 한다는 전제가 먼저 충족돼야 한다. 대신 연구실 책임자 평가가 좋지 않아 해고되면 동시에 연구실 전체를 파산시키는 방식이다. 인력선발부터 과제 수행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다.
연구실 파산제의 단점도 있다. 연구원들은 소속감이 떨어지고, 당장 시행에 대한 반발도 예상된다. 기관장은 명예직에 가까워지기에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해외로 눈을 돌려보자. 독일 드레스덴은 막스플랑크(기초연구기관) 연구소 몇 개 유치했는데 지역 경제 전체가 활성화됐다는 얘기가 있다. 대덕은 연구소만 20개가 넘고 대전시 1년 예산보다 많은 돈이 뿌려지고 있는데 과연 드레스덴을 넘어서는 성과를 내고 있는가.
한 번쯤 심각하게 생각해 보자는 얘기다. 어디 대덕만 그러하겠는가. 이제는 ‘계륵’으로 전락하고 있는 출연연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최후 수단’을 검토할 때도 됐다. 필요하다면 공론의 장을 열어도 좋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