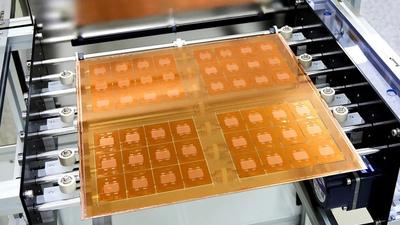“그 누구도 돈을 대출해 주지 않으려 했고 직원을 구하거나 사무실을 얻을 수 조차 없었습니다”.
나이지리아 소재 디지털 마케팅 기업 `와일드 퓨전(Wild Fusion)` 창업자인 아바샤마 이다르싯은 “8개월간 거리를 헤매며 고객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마케팅 모델을 끝없이 설득해야 했다”며 창업 초기 고충을 털어놨다. 검은 대륙의 열악한 조건에서 자라나는 IT 스타트업의 현실이다.
12일 로이터는 세계 최빈국 아프리카에서 인터넷·모바일 IT 스타트업 성장 엔진이 되려고 하지만 자금과 인터넷 인프라 부족으로 고전한다고 보도했다.
고전끝에 와일드 퓨전은 월 10만달러(약 1억원) 매출을 내는 기업으로 자라났다. 매출은 매년 두 배씩 성장 중이다. 기업 가치가 2000만달러(약 214억원)에 달하며 삼성을 비롯해 유니레버 등 글로벌 기업의 아프리카 현지 마케팅 전략을 맡고 있다.
이처럼 잠재력 있는 아프리카의 창업가는 늘고 있지만 제2, 제3의 와일드 퓨전이 될 수 있는 스타트업 지원 환경은 매우 피폐하다. 로이터는 “사업가나 투자 전문가도 아프리카가 인터넷 보급이 되지 않고 투자를 받기 힘든 데다 관리 전문가조차 없다고 평가한다”고 전했다. 같은 신흥 개발국이지만 아시아나 라틴아메리카에서 이같은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를 기대할 수 있는 것과 비교된다.
카메룬에서 온라인 구직 서비스를 선보인 한 창업자는 “아프리카의 많은 스타트업이 생태계가 없어 발목 잡혀 있다”며 “인재를 채용하려 해도 자금이 필요한데 실적이 있어야 자금을 구할 수 있어 사실상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 회사는 포브스가 꼽은 아프리카 최고 스타트업 중 하나였지만 사정은 매한가지였다.
ITU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인터넷 보급률은 전체 인구 1억 가운데 16%에 그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인 36%의 절반 수준인 셈이다. 가나의 경우 모바일 가입자는 인구 수에 육박한 가운데 인터넷 보급률은 3.5%에 불과하다. 모바일 산업은 발전하지만 이면의 인터넷 보급 상황은 무척 더디다. 로이터는 “인텔이나 JP모건 등이 아프리카 스타트업에 종종 투자하고 있지만 현지 사업가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