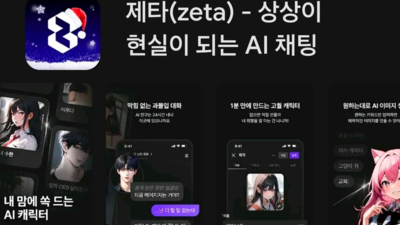전기세와 전기요금. 두 단어 모두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다. 사전은 `전기세`가 `전기료`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설명한다. 같은 말로 생각할 수 있지만 바른 표현은 `전기료`다. `세`와 `료`의 차이는 크다.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국민들로부터 강제 징수하는 것이다. 반면 요금은 개인적 필요에 따라 특정한 재화나 용역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지불하는 금전이다.
전기는 공익성이 강하고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돼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이 아니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돈을 내야 할 이유도 없다.
`전기료`라는 단어는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 우선 전기도 상품이라는 의미다. 상품이라면 소비자가 선택 가능 한 것이어야 한다. 공급자를 선택하거나 다른 대체상품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현실에서는 대안이 없어 보인다.
또 상품이라면 공급자는 생산비 이상을 받아 이윤을 내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국내 전기료는 원가를 밑돈다. 한국전력이 전력거래소로부터 100원에 전기를 산 뒤 고객인 국민에게 87원에 파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전기요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물론이고 아시아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일본의 전기요금은 우리의 2.8배, 필리핀은 2.4배, 중국도 1.4배에 이른다. 전기라는 상품이 싸다 보니 과도한 소비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판매자인 한전은 자의로 판매가격을 올릴 수도 없다. 전기료는 완전한 정부의 통제 하에 있다. 한전은 쌓여가는 적자에 시설관리와 설비투자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전기가 상품이라는 게 대전제지만 현상을 들여다보면 결코 상품이 아니다. 언제까지 이처럼 기이한 방식으로 상품을 팔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기본적 토대가 어긋난 상황에서 논하는 전력정책도 의미가 반감된다. 원가가 반영된 적정한 전기요금으로 에너지의 합리적 소비유도를 고민해야 할 때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