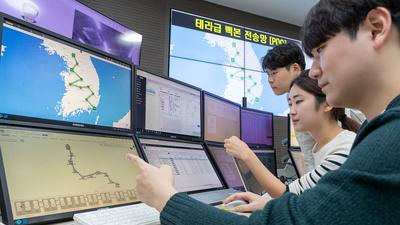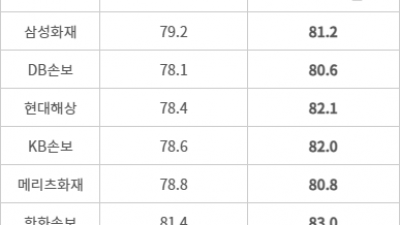불합리한 인증제도 때문에 국내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산업 활성화가 더디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규정은 지나치게 까다로워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고 있는 반면에 인체 유해성 논란이 불거진 플리커(깜박임) 규제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해외시장 진출에 애로가 예상된다. 세계 LED 조명 시장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면 국내 인증제도부터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플리커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일본이 지난해 전기용품안전인증(PSE)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킨 데 이어 미국도 최근 에너지스타를 통해 규제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향후 KC 인증을 통해 60㎐ 구동 제품의 플리커를 규제한다는 계획만 세워둔 상태다.
플리커는 광 민감성 발작이나 불안, 두통 등을 초래할 수 있지만 한국은 규제가 없어 소비자가 위험에 노출돼 있다.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미국·일본의 플리커 규제에 무방비다. 국내 시장에는 낮은 품질의 값싼 컨버터가 활개를 친다. 일부 기업이 플리커 문제를 해결한 컨버터를 출시했지만 높은 가격 탓에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다.
플리커 규제는 없는 반면에 KC 인증과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인증(이하 고효율인증)의 요구 사항은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일부 부품을 바꿀 때마다 인증을 새롭게 받아야 해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크다고 주장했다. 기존 인증을 획득한 제품과 차이가 크지 않으면 파생 모델로 분류돼 비교적 손쉽게 KC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효율인증은 요구 조건이 엄격해 아예 새롭게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일이 다반사다. LED 조명 업체 한 관계자는 “KC 인증과 고효율인증 획득에 각각 150만~200만원, 300만~400만원이 필요하다”며 “부품 업체가 도산하거나 원가 절감을 위해 부품을 변경할 경우 중소 업체들로서는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LED 조명과 컨버터를 하나의 제품으로 묶어 고효율인증을 부여하는 방식도 문제라는 목소리다. 컨버터 업체가 문을 닫거나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조명 업체 또한 인증을 새롭게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 소비자도 컨버터가 고장나면 정상적인 조명까지 모두 교체해야 한다. 한 컨버터 업체 대표는 “잘못된 인증제도 때문에 LED 조명과 컨버터 간 호환성이 떨어져 기업과 소비자 모두 불편을 겪는다”며 “정부가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들도 더욱 좋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