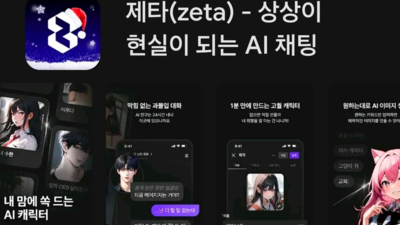누구나 알고 싶지만 감히 묻지 못하는 질문이었다. 망한 기업은 왜 실패했을까.
사회학자인 아서 시틴치콤은 `신생 기업의 위험`에서 대부분 조직 설립을 주도한 내부에서 비롯한 문제가 원인이라고 했다.
최근에 수행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다. 벤처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신이 투자한 회사 중 실패한 곳 65%가 경영진 내부 문제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경제를 탓하고 주변 환경을 탓하고 아랫사람을 탓하기 이전에 창업자 자기 자신부터 되돌아보라는 얘기다.
창업자의 미덕은 무엇일까. 창업자 대부분은 자신이 행동 지향적이고 낙관적이라는 점을 자랑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 분위기도 그런 적극적 인재를 원한다. 물론 열정은 새로운 기업을 살리는 데 필수지만 창업의 모든 단계를 그런 본능으로 넘겨버리면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체계적 계획보다는 감에 의존하거나 냉철한 논리보다는 고정관념에만 애착을 보인다면 모든 선택은 자신을 겨눈 화살이 되어 돌아온다. 늘 최악을 생각해야 한다.
창업 열기가 가득한 이 시점에서 찬물을 끼얹자는 것은 아니다. 신생기업 창업자라면 고정관념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회 분위기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자 한껏 고조돼 있다. 내로라하는 글로벌 기업이 어려운 시기에 창업했다는 건 상식이다. 대공황 때 모건스탠리와 버거킹이, 1970년대 석유파동 때 마이크로소프트(MS)와 페덱스가 탄생했다. 위기의식으로 무장한 창업자와 기대를 낮춘 투자자, 남아도는 우수한 인력이 잘 조합된 결과다.
우리나라 신규법인이 지난해 6만개가 넘었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성공률은 어떤가. 우리나라에서 10년을 버티는 기업은 고작 30% 남짓이다. 미국에서는 창업 기업 25%는 1년 내에 사라진다.
이 책은 창업을 앞두고 그야말로 딜레마에 빠진 예비 기업인이 직면한, 또 앞으로 직면할 보편적 문제를 피하는 방법을 `깨알같이` 알려준다.
딜레마란 선택해야 할 길은 두 가지 중 하나로 정해져 있는데 그 어느 쪽을 선택해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얘기다.
창업이란 끝없는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 책은 매우 디테일한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작성됐다. 심지어 투자 자금 속 자기자본 비율이나 지분 분배, 그리고 동업자가 예전 직장동료이거나 가족일 때 처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나와 있다.
창업 구상부터 향후 최고경영자(CEO) 직위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승계까지, 기업 운영 전 분야에 걸친 조언이 흥미롭다. 한 권의 백과사전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무리가 아니다.
이 책의 최대 강점은 풍부한 데이터베이스다. 저자인 노암 와서먼 교수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신생 기업을 조사하고자 기업 3607개사와 창업자 1만9000여명을 만났다. 인터넷 기업이 가장 활기를 띠었던 때부터 글로벌 경제의 먹구름이 드리운 후 회복했을 때까지 경기 순환 전 단계가 고스란히 녹아 있다.
많은 전문가가 신생 기업의 생존 및 실패율을 광범위하게 연구했지만 대부분 개별 사례나 에피소드 나열에 머무른 것과 대조적인 행보다.
특히 연구 기업의 절반 이상이 정보기술(IT)과 생명과학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최근 IT 관련 스타트업 열풍을 타고 창업하려는 젊은 기업가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암 와서먼 지음. 이형욱 옮김. 에코리브르 펴냄. 3만5000원.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