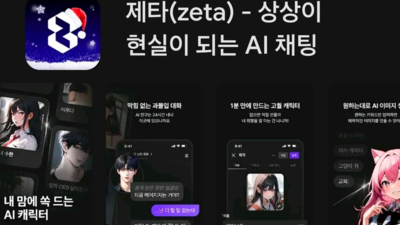굳이 연말연시가 아니더라도 인공조명으로 환한 도시의 밤은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하다. 단 한 시간의 불끄기에도 상당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문득 지금 우리가 쓰는 전기는 얼마나 먼 `여행` 끝에 서울에 도착하는지 궁금해졌다.
수도권은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40% 가량을 소비한다. 하지만 대형발전소는 수도권, 특히 서울에 자리하지 않는다. 원자력 발전소는 울진·고리·월성·영광에, 화력발전소는 서산·태안·당진에 집중돼 있다. 한국중부발전의 충청남도 보령화력본부에서 생산한 전력의 80%는 모두 서울 등 수도권으로 송전된다.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제조업과 인구의 6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700만㎾의 전력을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 신월성 2호기(100만㎾), 신고리 3호기(140만㎾), 율촌복합 2호기(57만㎾), 신울산복합(56만㎾), 신평택복합(48만㎾)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만들어진 전력은 송전탑과 변전소, 배전선 등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전국에는 지난해말 현재 4만1557개의 송전탑에 약 26만㎞의 송전선로가 설치됐다. 지구 둘레를 거의 일곱 바퀴 돌 수 있는 길이다.
문제는 송전탑 설치를 위한 지역주민의 동의다. 주민들은 송전선이 마을 들판을 관통하면 재산권 침해는 물론 주민들의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고압선 주변 지상의 땅값하락, 영농활동 등의 불편이 크다는 것이다. 이들이 송전탑 건설을 반대해 보상비를 높일 심산이라거나 공공의 이해를 저버리는 지역이기주의만 볼 것은 아니다. 송전선이 지나는 곳은 어김없이 경제·사회·환경 등의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송전탑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신고리 3·4호기 준공까지 송전탑 건설이 지연되면 남는 전력은 수요지로 보낼 방법이 없다. 또 민간발전의 메카로 떠오른 `삼척 발전클러스터` 역시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곧 발표될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적절성 여부보다 지역주민과의 마찰로 발생하는 건설공기 연장과 준공지연에 의한 전력 공급부족이 더 우려스러운 이유다.
송전탑 확보계획은 전력수급계획 보다 앞선 전제조건이다. 예산이 들더라도 송전선로 지중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한국전력의 송전탑 구축은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 선제적인 구축이 어렵다. 정부가 별도 예산으로 국가 주요 송전선로를 확보하고 나머지 지선을 한전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마지막 톨게이트인 군자요금소를 빠져나오면 차량 위로 고압송전선이 지나간다. 그 위용에 주눅이 들 정도다. 전력업계는 송전선로를 빨랫줄로 빗대어 부른다. 송전선로는 대용량 전기를 수송하는 고속도로와 같다. 생산된 전력을 보내주는 송전탑 건설일정을 맞추지 못하면 발전소를 건설하고도 운전을 못하게 되는 최악의 상태에 직면할 수 있다.
김동석 그린데일리 부장 d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