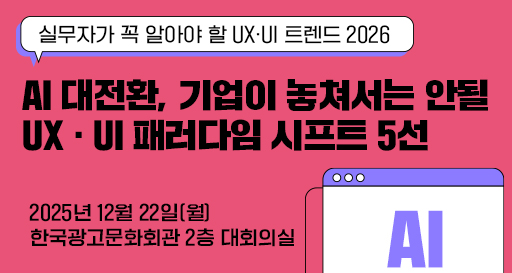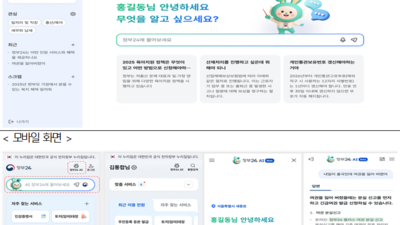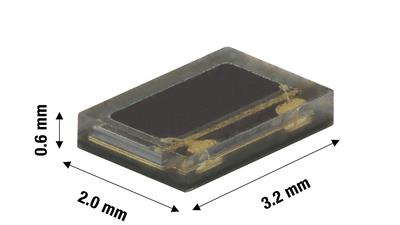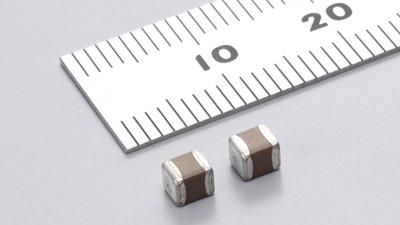종합편성채널이 최근 유료방송사업자에 수신료를 요구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의무재전송 채널인데다 지상파와 인접한 프라임채널까지 편성 받은 종편이 도를 넘은 욕심을 부린다는 지적이다. 다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나 의무전송채널과 비교하면 또다시 과다한 특혜 요구다.
유료방송사업자의 반발에 수긍이 간다. 의무전송으로 묶인 탓에 채널 송출 여부를 결정할 권한도 없는 처지인데 수신료까지 지급해달라는 것은 문제라는 항변이다. 프라임채널로 편성돼 다른 PP보다 특권을 받는 처지에서 PP에 지급하는 수신료 파이의 일부를 떼어달라는 요구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종편은 공익성을 앞세워 의무재전송 채널로 지정됐다는 점에서 유료방송사업자들은 갑작스러운 수신료 요구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종편이 수신료를 계속 고집한다면 이참에 의무전송채널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물론 종편의 욕심도 이해할 수는 있다. 다른 의무전송 채널인 YTN이 유료방송사업자에 수신료를 받는다는 게 근거다. 더 솔직한 속내는 한 푼이라도 더 긁어모아 심각한 경영난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하지만 YTN은 다른 공공·공익채널이 수신료를 받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예외적이다. YTN은 사실상 정부 산하 공기업의 성격인데다 출범 당시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극히 이례적으로 수신료를 받기 시작했다. 시장 경제 논리의 미디어 산업 판에 뛰어든 종편이 겉으로 `공공·공익`을 내세우며 자가당착적인 주장을 반복하는 것과는 다르다. 예외는 예외 하나로 족할 뿐, 예외의 물꼬를 트게 되면 시장질서가 혼란스러워진다.
결국 논란의 배경에는 법·제도와 그것을 만든 정부가 있다. 현행 방송법에 의무전송채널 수신료가 명시되지 않은 게 단적인 현실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종편을 탄생시킨 원죄를 안고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미디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현상을 책임 있게 정리하는 일은 누구도 아닌 정부의 몫이다.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콘텐츠칼럼]게임법 전부개정안, P2E 허용 논란에 대한 우려와 제언
-
2
[보안칼럼] OSINT, 사이버 기반 조직범죄 꿰뚫다
-
3
[미래포럼] 자율주행의 완성, 차(Car)와 인프라를 하나로 묶는 'SW 플랫폼'에 있다
-
4
[이상직 변호사의 생성과 소멸] 〈9〉AI버블 논쟁과 조란 맘다니의 뉴욕시장 당선 (하)
-
5
[김경환 변호사의 디지털법] 〈64〉타인 상표를 이용한 키워드 검색 광고는 상표권 침해인가?
-
6
[사이언스온고지신]탄소중립을 위한 바이오에너지 현황과 과제
-
7
[기고]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한 단상: 표현의 자유는 안전한가?
-
8
[인사] 현대해상
-
9
[인사] 교보생명
-
10
[김경진의 AI전략노트]〈17〉AI 대전환 시대, 장기계획 설계할 조직이 필요하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