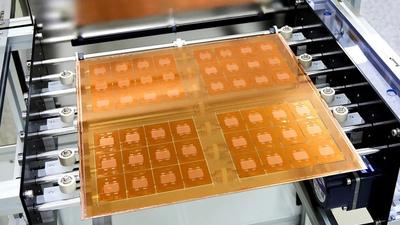과학기술인은 현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어떻게 평가할까. 전국 정부출연기관에서 일하는 1402명 연구원에게 직접 물었다.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현장 연구원의 평가는 예상보다 냉혹했다. 열에 아홉이 아니라, 100에 99명이 낙제점을 주었다. `지난 5년간 과기 정책을 잘 운영했다`는 응답은 고작 `1%` 수준이다. `전담부처가 사라지면서 자율적인 연구 환경이 더 나빠졌다`는 응답도 86.5%나 차지했다. 현장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조차 현 정부가 추진한 과기 정책에 불만이 많은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출범과 함께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합쳐 교육과학기술부를 만들었다. 4년여가 흐른 지금 과학기술 정책은 찬밥 신세다. 관련 조직과 기능은 고사(枯死) 위기다. 과학기술과 교육을 한데 묶은 현 정부의 무모한(?) `실험`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 출연연 연구원들이 꼽은 가장 잘못한 정책 1순위가 `과학기술 전담부처 폐지(89.2%)`다. 과학기술부가 사라지면서 연구 환경이 더욱 불안해졌다는 얘기다.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위상과 처우 하락(76.6%)`을 실패 정책 2순위로 꼽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휴대폰, 조선, 자동차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확보한 것은 누가 뭐래도 과학기술 덕분이다. 그럼에도 2012년, 대한민국 과학기술인은 불행하다.
지난 1960·1970년대와 비교해도 위상과 처우가 예전만 못하다.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겪으며 이공계 인력은 퇴출 대상 우선순위가 됐다. 그만큼 현장 연구자의 불안감도 커졌다. 실제로 우수한 인재는 과학기술을 기피하며 산업현장을 떠난다. 이공계 학생은 자신의 전공을 버리고 의대나 사법시험에 매달린다. 과학자의 자긍심에 걸맞은 사회적 인식과 대우가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이를 외면하는 모순된 구조다.
`과학은 21세기 대한민국의 꿈이며, 선진 일류국가로 비상하는 날개`라는 화려한 구호 앞에 우리 과학기술인은 갈수록 초라해진다. 과학이 단순히 경제발전 도구로 전락하면서 정치권 관심도 줄었다.
이대로 가면 미래를 생각해야 하는 과학기술은 말라죽을 수밖에 없다. 평생 연구만 하던 과학자들도 이제 길거리로 뛰쳐나와 실험기구 대신에 피켓을 들어야 할 형편이다. 미래를 설계하고 예측하는 과학자들이 오죽하면 50년 전 옛 시절이 좋았다고 말할까.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다. 정부는 매년 엄청난 돈을 쏟아붓지만, 대한민국 과학기술인은 행복하지 않다.
돈과 권력이 곧 행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과학자는 돈 때문에 연구하는 게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해외 과학자 유치에 앞장섰던 최형섭(崔亨燮) 전 과학기술처 장관은 항상 연구자로서의 자부심을 강조했다. `조국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자부심 하나에 과학자는 움직인다.
과학기술의 핵심은 창조다. 과학과 기술로 사회를 바꾸는 새로운 창조를 못하면 더 이상 과학자가 아니다. 창조는 연구실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고와 대화 속에서 이뤄진다. 과학자가 누구보다 행복해야 할 이유다. 새로운 것을 만들려면 행복해야 한다. 창조와 행복, 두 바퀴가 맞아떨어져야 한다. 과학기술 정책의 해답도 여기에 있다. 과학기술인이 불행한 나라가 행복해질 수는 없다. 그것이 필연(必然)이고, 과학이다.
벤처경제총괄 부국장 sd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