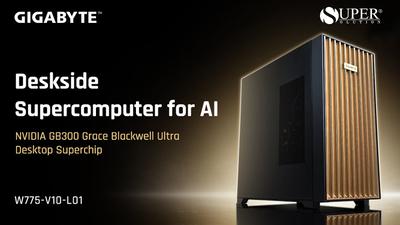A기업의 수도권 생산 공장은 최근 하루 두 번씩 비상발전기를 가동해 자체 전력을 생산한다. 전력공급이 끊긴 비상상황은 아니지만 최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절약 조치에 부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법이다.
이 사업장은 비상발전기를 가동하면서부터 비상발전기 원료 구매 비용으로 하루에만 수십만원을 추가 지출하고 있다.
공장 관계자는 “우리뿐만 아니라 대규모 사업장들 상당수가 절약만으로는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추기 어려워 결국은 전력을 자체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15일부터 계약 전력 1000㎾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루 4시간 피크시간대(10시~12시, 17시~19시) 전력사용량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최대 10%까지 줄이도록 하는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실시했다.
비상발전기 가동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다. 단기간 전력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조업시간을 변경하거나 생산시간을 단축하기 어려운 사업장 성격상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비상발전기 운영에 따른 비용도 결국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디젤이나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하는 비상발전기 발전단가는 디젤은 228원/㎾, LNG는 204원/㎾ 수준이다. 한전에서 받아쓰는 전기요금이 132원/㎾인 것을 감안하면 40~50% 가량 비싼 전기를 사용하는 셈이다.
실제로 LNG를 원료로 하는 1000㎾ 비상발전기를 하루 4시간 가동하면 같은 양의 전력을 한전에서 받아쓰는 것보다 비용이 25만원가량 더 소요된다.
업계로서는 사실상 자비로 국가 전력피크 감소에 기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이 없는 것이 불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매년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에너지비용을 줄여온 상황에서 대다수 사업장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비상발전기를 통한 전력생산이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라며 “민간 분야에서 생산한 전력으로 피크를 억제하는 만큼 이에 대한 비용 회피효과를 인센티브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정부가 비상발전기를 수요관리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타당성을 얻고 있다.
한전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500㎾이상 비상발전기 용량은 886만㎾(8914대)로 원자력 발전기 9기와 맞먹는다.
지경부 관계자는 “정부가 비상발전기 현황을 파악해 수요관리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인센티브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산업용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고 지금까지 원가 이하의 전력을 공급받아왔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현재 대규모 전력수요처가 책임을 분담하는 체제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