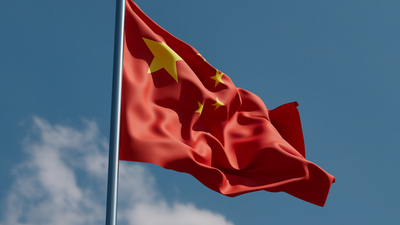제조업 강국 독일은 ‘마이스터(명장)’에 대한 대우가 각별하다.
취업할 때 대졸자 이상의 대우를 하고, 일반 기술자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한다.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실력을 인정받고 존중받는다.
독일 대학 진학률은 30% 수준에 불과하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나머지 70% 학생들은 실업학교를 거쳐 직업학교에서 마이스터가 되기 위한 수업을 받는다. 산업체와 연계한 실습 교육이 핵심이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마이스터 자격 취득이다.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밀레, 헨켈. 모두 독일이 자랑하는 기업들이다. 공통점은 이들이 만든 제품에 마이스터 정신이 녹아 있다는 사실이다. 견고하면서 실용적이고, 오래 써도 질리지 않는 명품이 마이스터 손에서 탄생된다.
우리 교육계도 마이스터 양성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독일의 마이스터 자격 제도를 벤치마킹한 마이스터고가 대표적이다. 기술 중심 교육을 통해 예비 마이스터를 양성하는 학교다. 학교 현장도 변화가 감지된다.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앞 다퉈 도입하고 있다.
최근엔 전문계 고교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가 화제다. 고교 졸업생의 취업을 공기업, 금융기관, 민간기업에 확산시키겠다는 것이 골자다.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에 대한 전액 학비 지원과 산학 연계를 바탕으로 ‘선취업 후진학’의 기회를 넓히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가장 시급한 것은 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 일이다. 이미 우리 사회는 고학력 인플레이션에 중독돼 있다.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임금을 낮게 책정해서는 안 된다. 내 자식만큼은 전문계 고교에 보낼 수 없다는 인식도 바꿔야 한다.
정부도 직업 교육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교육계에서는 벌써부터 정권이 바뀌면 현재 추진하는 전문계고 육성 정책도 함께 없어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진정한 기술 강국이 되려면 기술자를 존중하고 우대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