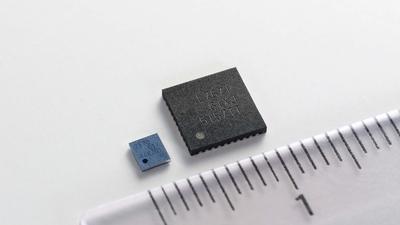정부와 발전사들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태양광발전 입찰참가자격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기준을 적용할 뿐 아니라 태양광모듈 원산지도 GPA 회원국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RPS 시행으로 내년부터 연간 200㎿, 약 1000억원 규모로 형성될 국내 태양광 시장에 중국산 태양광모듈을 가지고서는 입찰하지 못한다. 일부 GPA 회원국 이외 나라에 모듈 생산 공장을 갖추고 있는 업체들도 참여할 수 없게 됐다.
국내 태양광 시장이 중국산 저가 태양광모듈에 잠식된 경험이 있어, 정부가 어쩔 수 없이 국내 산업보호 차원에서 이 같은 조항을 마련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내 기업이 중국에 태양광모듈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와 GPA 회원국 태양광 기업이 이외 지역의 공장에서 모듈을 생산하는 경우 입찰 참여 불가라는 ‘날벼락’을 맞은 상황이다. 중국산을 막기 위한 규정을 만든 것인데 덩달아 된서리를 맞게 된 것.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받게 된 기업들은 대사관을 통해 지식경제부에 항의하거나, 아예 RPS 시장을 포기하는 상황이다.
과거와 다르게 국내 태양광기업들은 대부분 대기업으로 재편한 상황이고, 내수보다는 수출 비중이 크다. 어차피 중국 태양광기업이라는 벽을 넘지 않고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며,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 목표는 여기에 맞춰져 있다. 그런데 정부는 RPS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라는 이유로 다소 무리라고 생각될 정도의 무역장벽을 세웠고, 이에 대한 다른 국가의 항의까지 받고 있다. 자칫 이 RPS 원산지 규제는 더 큰 시장인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우리 기업들을 배척할 수도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는데도 말이다.
우리 태양광기업의 경쟁력은 5년 전과 다르다. 태양광모듈 가격 및 품질 모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나가고 있다.
RPS 원산지 규제가 국내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한 울타리일지, 수출전선에 해를 끼칠 ‘과잉보호’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