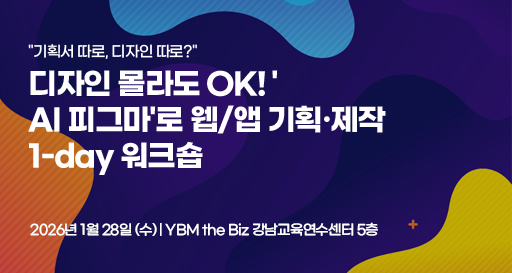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2년 반을 험난하게 돌고 돌았다. 결국 ‘집나간 자식’은 와야할 곳으로 돌아왔다.
과학비즈니스벨트가 대전 유성 신동 및 둔곡지구로 최종 결정났다. 그러나 피해자는 많았다. 과학벨트 후보지가 됐던 전국 53개 시도 모두가 피해자였다. 정부 의도가 기초과학을 일으키자는 것이었는데, 왜 그들 모두가 상처를 입었을까? 정치권은 그 답을 잘 알고 있다. 그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기실 과학벨트가 선정된 위치를 들여다보면 참 절묘하다. 그만큼 정부가 고뇌했다. 중이온 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이 들어설 거점지구인 대전 유성구 신동과 둔곡지구는 충남 세종시와 출연연구기관이 운집해 있는 대덕연구단지와 중간지역에 위치한다. 연구단지서 세종시든 오송·오창이든 자동차로 20분이면 넉넉히 갈 수 있다.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유성구)은 “과학벨트가 일정부분 지역별로 나눠 가진 정치적인 결정이 깔려 있다는 걸 인정한다”면서 “이제는 과학벨트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 지 지역별로 여론을 모으고, 협력모델을 발굴하는 작업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대덕특구가 거점인만큼 출연연구기관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TF를 구성하자는 말도 꺼내놨다.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과학벨트는 올해 말로 예정된 기초과학연구원장 선정부터 잘해야 한다. 단순히 개인 스펙쌓기를 위해 기관장 자리를 기웃거리고, 새로운 자리나 탐내는 인물은 곤란하다.
연구원 처우도 함께 풀어야할 숙제다. 다음 달 연구원 정년을 환원하는 법안의 국회심의를 앞두고 있지만 결코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대덕연구단지 내 연구원들은 벌써부터 술렁인다. 대우가 좋고, 안정적 연구기반이 마련될 기초과학연구원으로의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
연구 분위기도 조성해야 한다. 독일처럼 오전시간 동료들과 담소하며 아이디어를 모으고 밤새 연구하는 모습을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나름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자율적인 연구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도 각종 보고서나 감사로 연구원을 서류작업에 내몰 것이 아니라, 연구성과와 실패요인 중심으로 관리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이광형 KAIST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는 “얼마 전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서 연구비를 유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전도유망한 교수가 목숨을 버렸다. 잘못한 건 맞지만, 실수와 고의성 정도는 구분해야 하고 세계적인 연구성과에 대한 정상참작도 있어야 했다”며 섭섭한 감정을 드러냈다.
지난 23일엔 대덕연구단지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출연연에 경찰이 출동해 압수수색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서울 경찰청 직원 6명이 1년 예산 40억원에 불과한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 들이닥쳐 회계장부와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해 갔다. 이 기관은 패닉 상태다.
과학기술인들은 국책연구기관과 과학기술계 위상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라고 입을 모으면서도 못난 자신들을 탓하기도 했다. 과학벨트는 이제 과학기술계의 ‘이상’이 됐다.
박희범 전국취재팀 부장 hbpark@etnews.co.kr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