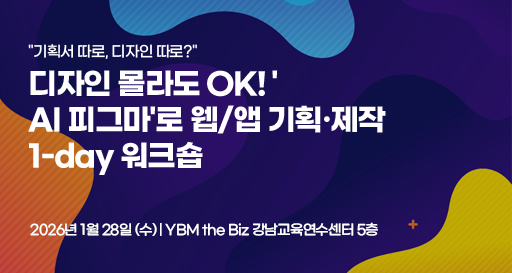스포츠계엔 ‘심판 판정 오류도 경기의 일부’라는 해석이 정설로 통한다. 기계나, 컴퓨터가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판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경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초래하더라도 결과가 바뀔 수 없다는 논지다. 심판도 그래서 독자적인 권한을 갖고 결정을 내리고, 선수는 그것을 따라야 한다.
그런데, 이 심판이 중립적 판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의 선수로 뛴다면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이것은 경기가 아니라, 장난이 되고 만다. 이같이 장난 같은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 금융권에서 벌어지고 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금융감독원이 심판으로서 공정하게 경기를 운영하고, 최선의 결과를 뽑아낼 노력은 하지 않은 채 경기에 뒤섞여 온갖 파울(비리)을 만들고, 직접 가담해 온 정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근본문제는 저축은행 사태가 터진지 석달이 넘도록 상황논리를 앞세워 책임은 요리조리 피하고, 말 뿐인 대책만 내놓는 금감원의 심리상태다. ‘소나기는 피해가면 된다’는 무사안일주의와 ‘나만 아니면 된다’는 보신주의가 조직 전체에 깔려 있으니 제대로 된 심판 역할은 뒷전일 수 밖에 없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저축은행 청문회’에서 권혁세 금감원장은 “저축은행 대주주의 모럴해저드와 무리한 외형 확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났으며, 여기에 감독의 한계도 물론 있었다”고 말했다. 대다수 정무위원들의 지적대로 금감원은 저축은행 사태의 직접적 원인에 대해 ‘자기탓’이라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검찰 수사를 통해 저축은행의 불법 여신과 분식회계에 금감원 출신자들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는 위증에 가까운 책임 회피임이 드러났다. 식구가 감사를 보고 있어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그런 관행이 대주주의 모럴해저드와 외형 경쟁과 맞물려 상승작용을 일으켜 문제가 터진 것이다.
정부 조직인 금융위원회도 이같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아무리 금융위의 주 역할을 정책·법제도 시행 등에 국한시키더라도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금감원을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은 금융위 밖에 없다. 감독 위의 감독이 한 집안 사람들로 이뤄지다보니 제대로 될리 만무하다.
지난 4일 대통령이 금감원을 방문해 “여러분은 조직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한 것은 금융위를 향해 던지는 경고성메시지였다.
국민은 그동안 금융권력이 시장에서 군림하면서 만들어낸 추잡한 결과물들을 보면서 불신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뒤늦게 금감원은 출신 직원을 금융회사 감사로 추천하는 제도를 철폐했다. 설사 금융회사로부터 영입 요청이 와도 모두 거절하겠다고도 했다. 그런데, 이런 제도 자체가 있었던 것 조차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국민은 심판이 정확한 경기 규칙에 따라 공정한 경기를 이끌길 바란다. 사실 제도는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다. 정정당당하게 플레이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면 된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
 이진호 기자기사 더보기
이진호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