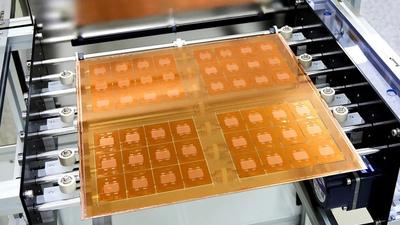‘전 세계 월별 실질 사용자(MAU) 3000만명, 일본 단일 시장 규모 3조원, 전년 대비 시장 성장률 185%, 회사 설립 2년 만에 5000억원 규모의 미국·일본의 M&A.’ 이 글의 주인공은 다름아닌 소셜 네트워크 게임(SNG)이다.
SNG가 주목받기 시작한 건 최근이다. 성장동력을 잃었다고 평가되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페이스북이 강력한 경쟁자 마이스페이스를 누르고 다시 급성장했던 2009년 하반기. 이 놀라운 부활의 뒤에 게임회사 징가(Zynga)의 ‘텍사스 홀뎀’과 ‘마피아 워’ ‘팜빌’이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부터다.
국내 게임 산업에서 이러한 호재를 간과할 리 만무한 법. 거대 SNG 시장에 뛰어들고자 앞다퉈 ‘레디(Ready)’했으나, 정작 플레이에 들어가자마자 실소를 터트릴 수밖에 없었다. 반전이었다. 10년 전쯤에나 통했을 게임 디자인, 조악한 플래시 작업의 그래픽, 플레이를 진행할수록 느끼는 대충 흘러가는 듯한 엉성한 밸런스까지.
국내 개발자들에게 SNG를 만들라는 이야기는 모욕적으로 들리거나,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몇 배 더 훌륭하게 만들 수 있는 초보 게임시장으로 보였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해외시장에서 우리 SNG들은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야만 했다. 국내 SNG 시장의 대표 주자로서 언론의 주목을 받던 회사의 페이스북 게임은 MAU 2만~3만 수준을 넘지 못했고, 국내 유수의 개발사 출신자들이 내놓은 게임 역시 MAU 10만을 넘지 못했다. ‘징가’가 150만 MAU를 넘지 못한다는 이유로 게임서비스를 중단하는 상황에 비하면 이 결과는 낭패스럽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일까. 원인은 오해에 있다. SNG가 무엇이며, 플레이어가 누구인지 이해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SNG의 형태는 게임이지만 우리가 알던 게임과는 다르다. ‘팜빌’ 플레이어들에게 게임의 재미요소는 중요치 않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다름 아닌 ‘친구’다. SNS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단순히 게임을 제공하는 공간이 하나 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친구 관계를 근본 축으로 하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게임이 등장함을 의미한다.
수많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커뮤니티를 발전시킨 국내 개발사들은 이런 친구 관계 정도는 쉽게 디자인할 수 있다고 오판한 것이다. 게임을 위한 커뮤니티와 커뮤니티를 위한 게임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친구 관계로 인해 게임을 하는 SNG의 성격 때문에, 게임을 시작한 사람들 역시 게임의 재미를 평가하고 접근했던 게이머들이 아니게 된다. 이들은 게임을 하기 위해서가 아닌 친교를 위해 게임을 하는, 굳이 표현하자면 ‘논(non)게이머’인 셈이다.
이렇게 보면 국내 개발사들의 초라한 성적표가 조금은 이해된다. SNG의 화려한 겉모습에 매료되었을 뿐, 그 안에 소박하지만 친구와 함께 하고픈 인지상정을 보지 못한 게 문제였다. 문제를 알면 해법은 있다. SNG가 가지는 특징과 SNG 소비자의 얼굴을 진지하게 들여다 보면 된다. 이 정도 게임은 누구나 만든다는 오만 대신 소비자가 SNG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게임을 통해 사람을 찾는 SNG의 복고적이면서도 가장 자본주의적인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들의 수준에 맞는 더 쉽고, 더 편하게 만들면 된다. 그리고 나서 아직 SNG가 실현 못한 우리의 장점을 찾아 더하면 된다. 더 이상 화려한 기사들이 남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꿈에 멈출 수는 없으니 말이다.
박상우 게임평론가 textlab0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