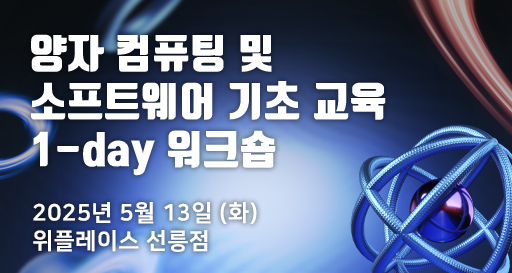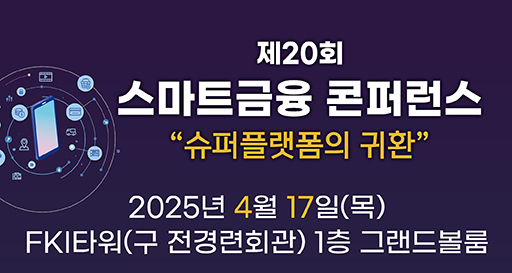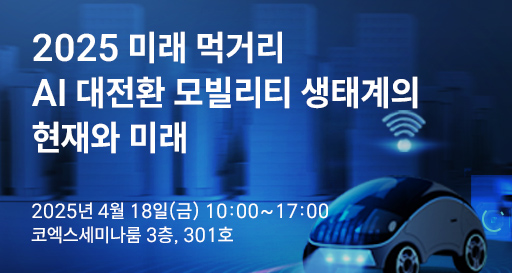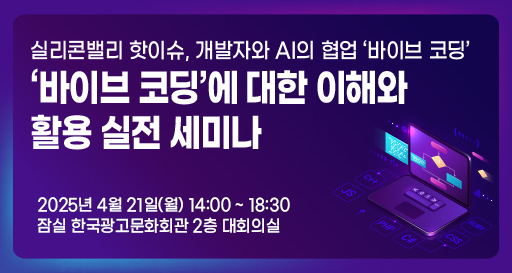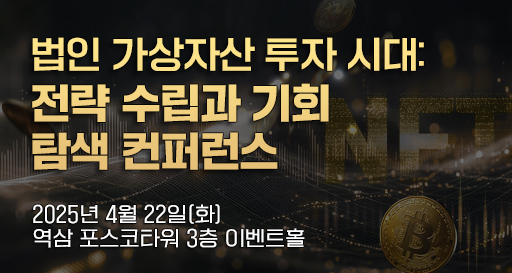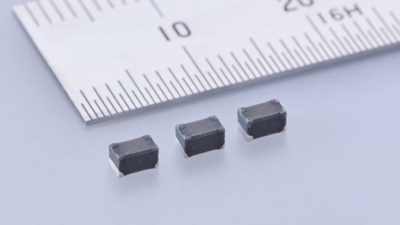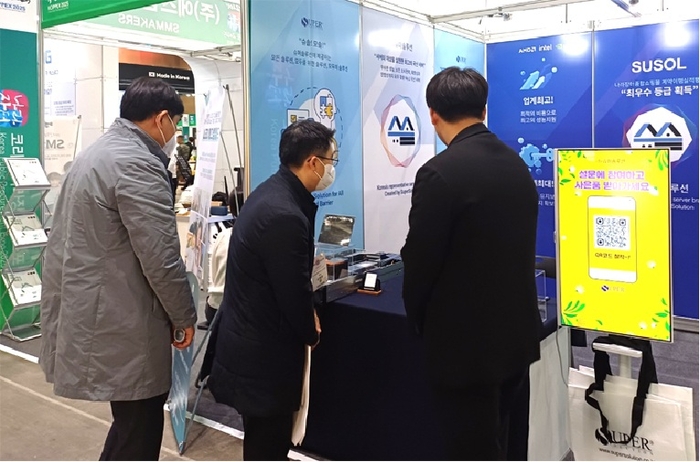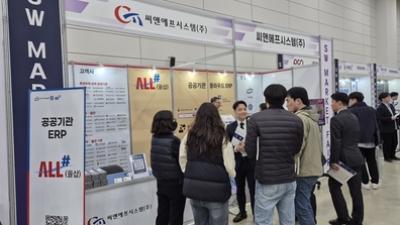“게임 이용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개인과 가정의 자기 결정을 침해하고 행복 추구권을 가로막는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한양대 법학과 황성기 교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서 논의되는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 제한, 이른바 `셧다운` 제도는 “국가가 법을 통해 가정에 개입하려는 시도”라고 진단했다.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부모의 자연권을 침해한다는 것. 아동 폭력이나 학대는 국가가 개입할 수 있지만 게임 이용에 대한 판단과 같은 문제는 가정의 몫이란 설명이다.
또 강제적 셧다운은 청소년들의 놀 수 있는 권리,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황 교수는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놀 권리 역시 중요한 권리 중 하나로, 이를 제약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과거 청소년의 당구장 출입 금지가 위헌 판결을 받은 것과 유사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술, 담배는 유해성이 명백해 청소년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지만 게임은 유해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더구나 게임은 이미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거쳐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이에 대해 다시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다. 중복 규제가 되는 것이다.
`온라인게임`에 대해서만 규제하면서 콘솔이나 PC 패키지 게임 등 다른 플랫폼 게임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온라인게임이 콘솔 게임에 비해 훨씬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아, 온라인게임에 대한 차단만으로도 청소년 게임 이용 감소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황 교수는 “입법 목적이 좋은 법이라도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 법의 관할 문제나 게임에 대한 전문성 문제 등도 문제로 지적했다. 법 체계의 정당성이나 규제의 효율성 및 일관성 측면에서도 게임법과 청소년보호법으로 규제가 갈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황 교수는 “게임을 둘러싼 문제는 셧다운과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성격인데 자꾸 희생양을 찾아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게임 기업들이 청소년 보호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부모들에게 적극 알려, 청소년 보호 시스템을 잘 갖춘 게임이 시장의 선택을 받도록 하는 등 자율 규제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시장 원리가 청소년을 보호하는 쪽으로 작동하도록 하려는 시도다. 또 취약 가정에 대한 업계와 정부의 지원도 강조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