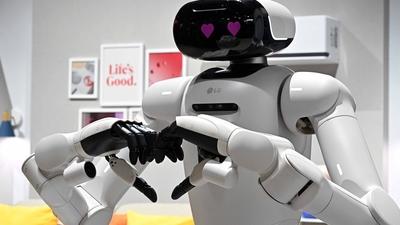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KT의 u헬스케어 솔루션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KT의 u헬스케어 솔루션 지난해 초 KT는 SD부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병원과 ‘u헬스 전문 조인트벤처’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다. KT가 170억원을 출자해 지분 50%를 확보, KT 전용단말을 이용해 환자 개인별 상담관리와 정보 전달을 한다는 게 사업의 골자였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마지막 단계에서 결국 폐기되고 말았다. 수익성 등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국내 의료법으로는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실제로 일선 통신사업자들은 헬스케어 시장 진출의 최대 걸림돌로 의료 관련 현행법 등 유무형의 각종 규제를 꼽는다.
현재 국내에서 일부 기업이 서비스하는 u헬스케어 서비스는 엄밀히 말해, 진정한 u헬스케어 서비스가 아니다. e헬스케어와 u헬스케어의 중간 단계다. 최근 발주되는 각종 u헬스케어 사업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시범 사업이다. 현행 의료법의 저촉을 피한 고육책이다.
u헬스케어 서비스 확산의 큰 장벽 중 하나는 진료 결과의 책임 소재 문제다. 원격진료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통신상의 문제·원격 의료기기 및 영상모니터 신뢰성 문제 등은 어떻게 규정짓는지다.
정부가 원격진료를 법적으로 허용하더라도 책임 소재 논란은 여전할 전망이다. 예컨대, 모니터가 환자 얼굴 색·미세 경련·동공 반사 등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해 생기는 오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진료과목 영역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김석화 서울대 의대 교수는 “미국은 이미 1997년 연방원격의료법이 제정돼 원격진료를 시작했고, 2002년에는 건강정보관련 법률인 ‘HIPPA’(Health Insurance and Accountability Act)에 개인의료정보보호를 위한 규정을 포함해 의료정보화가 가능하다. 일본과 유럽 역시 u헬스 시스템 개발에 투자비를 증액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원격의료가 여전히 의사 간에만 허용되는 등 법적 미비점이 많아,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EU 등과의 u헬스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김 교수의 우려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