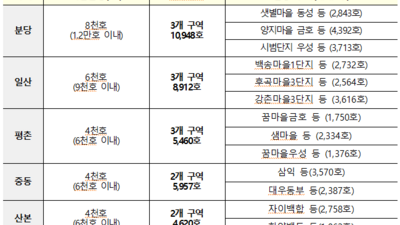“곧바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분야에 치중하다 보니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낮습니다.” 지난해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이 ‘상당히’ 낮은 IT부품업체 A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선행 기술이 아닌 현행 기술 개발에 투입되는 비용은 사업보고서상 ‘연구개발비용’이 아닌 제조경비(인건비)’로 분류되기 때문에 R&D 투자 규모가 줄었습니다.” 지난해 실제 R&D 투자 규모가 연초 계획의 60% 선에 머문 IT 대기업 B사 관계자의 말이다.
대·중소기업 할 것 없이 R&D 불감증이 심각하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벤처기업은 또 그들대로 여러 이유를 들며 R&D 투자 비중을 낮추고 있다.
이른바 ‘잘 나가는’ 기업에 속하는 이들이 그러하니 다른 기업은 더 말할 나위 없다.
IT기업이 환율하락, 유가급등, 원자재가 상승 등 여러 악재에 시달리는 상황은 십분 이해되지만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는 반응의 차이다.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이 전년에 비해 크게 떨어진 IT장비업체 C사에 그 배경을 물어보니 ‘지난해 매출이 크게 늘어 자연스레 투자 비율이 낮아졌다’는 대답이 돌아온다. 결국 매출이 늘어난다고, 회사 사정이 좋아진다고 해서 미래 지향적인 R&D 투자를 강화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여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대 IT제조업체 중 지난해 순이익이 증가한 8개사 가운데 R&D 투자 비율을 높인 업체는 세 곳에 불과했다.
‘샌드위치’니 ‘트리플악재’니 위기감을 조성하는 대외변수가 난무하지만 막상 차분하게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기르는 기업은 드물다. 기술로 먹고 사는 기업이 R&D 투자에 인색하다면 무엇으로 경쟁력을 높이겠는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사정이 이러이러하니 우리 회사의 R&D 투자 비중이 낮다는 것을 보도하지 말아 달라’는 A사 관계자의 마지막 말이다. 치료가 불가능한 지경의 불감증은 아니라고 해석돼 그나마 위안이 된다.
이호준기자·정책팀@전자신문, newlevel@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中 반도체 설비 투자, 내년 꺾인다…韓 소부장도 영향권”
-
2
기계연, '생산성 6.5배' 늘리는 600㎜ 대면적 반도체 패키징 기술 실용화
-
3
네이버멤버십 플러스 가입자, 넷플릭스 무료로 본다
-
4
KT 28일 인사·조직개편 유력…슬림화로 AI 시장대응속도 강화
-
5
삼성전자, 27일 사장단 인사...실적부진 DS부문 쇄신 전망
-
6
'주사율 한계 돌파' 삼성D, 세계 첫 500Hz 패널 개발
-
7
K조선 새 먹거리 '美 해군 MRO'
-
8
美 캘리포니아 등 6개주, 내년부터 '전기차 판매 의무화'
-
9
상장폐지 회피 차단…한계기업 조기 퇴출
-
10
GM, 美 전기차 판매 '쑥쑥'… '게임 체인저' 부상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