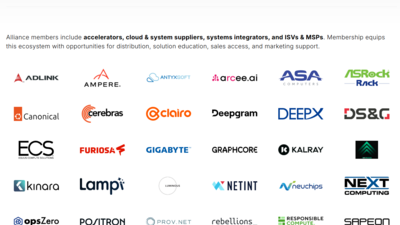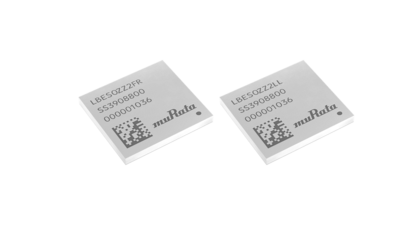‘닌텐도.’
세계 3대 게임업체인 일본의 닌텐도는 우리에겐 슈퍼마리오를 개발한 회사로 친숙하다. 그러나 그 닌텐도는 단순한 게임업체 수준을 넘어서 일본 경제를 들여다보는 키워드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소니’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전자산업의 신화를, ‘도요타’가 멈추지 않는 일본 제조업의 파워를, ‘NTT’가 일본식 통신시장의 구조개편을 상징하듯 닌텐도 역시 일본을 읽는 키워드다.
닌텐도는 일본 전통의 힘을 상징하는 ‘시니세’를 대표한다. 시니세는 한 가지 사업을 몇 십년간 지속해 온 상점을 일컫는 말인데 일본에는 100년 전통의 시니세가 수없이 존재한다. 메이지 22년(1889년)에 창업한 닌텐도에도 이 전통의 맥이 살아 숨쉰다. 닌텐도는 또 일본 경제가 미국 꽁무니만 따라다니다 슬슬 고개를 치켜세우던 80년 초반, 패밀리컴퓨터(패미콤)를 내놓으며 새 지평을 열었다.
슈퍼마리오는 이즈음 등장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가정용게임기’ 시장을 새롭게 일궈낸 일등공신이다. ‘83년 닌텐도 패미콤 출시’는 미국이 없는 미지의 영역에 도전한 일본을 상징하며 경제 연표에서 빠지지 않고 있다.
최근 이 키워드가 흔들리고 있다.
지난 3일 발표한 중간결산(4∼9월)에서 닌텐도는 62년 증시 상장이래 처음으로 30억엔의 적자를 기록했다. 세계 가정용게임시장의 파이오니어가 보인 적자는 이른바 ‘큐브의 오산’에서 비롯됐다.
닌텐도는 83년 패미콤 출시이후 가정용게임기를 세 번 내놓았고 그때마다 대박을 터뜨렸다. 특히 91년에 선보인 슈퍼패미콤은 93년 3월 결산에서 1593억엔(1조6000억원)이란 영업이익을 가져다줬다. 그런데 2001년 내놓은 신기종 ‘게임큐브’가 고전을 거듭하고 있다. 급기야 닌텐도는 올초 게임큐브 생산라인을 일시 정지하기까지 했다.
새 모델 출시후 3년간 돈을 벌어가는 닌텐도의 수익모델이 일거에 흔들리며 ‘큐브의 오산’이 세인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옛 영광에 얽매여 있는 닌텐도가 플레이스테이션2의 소니와 X박스의 MS라는 경쟁자들과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여기에 닌텐도가 독식해온 휴대용게임기 시장에 노키아와 소니가 도전장을 내놨다. 노키아는 최근 엔게이지라는 휴대폰 겸용 게임기를 팔기 시작했으며 소니도 내년에 휴대용게임기를 출시할 예정이다.
궁지에 몰린 슈퍼마리오도 반격에 나섰다. 게임큐브의 가격을 낮춰 발등의 불을 끄는 한편 거대 중국 시장에 경쟁사보다 먼저 들어가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을 드러내고 있다. 또 다른 카드는 ‘기술력’이다. 휴대용게임기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봄께 미국의 한 반도체업체에 1500만달러를 출자, 휴대용게임소프트용 대용량 메모리 개발에 착수했다.
그러나 닌텐도의 진정한 문제는 손에 꼭 쥔 현금 7500억엔(7조5000억원)이다. 몇 십년간 벌어놓은 돈을 쓰려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 돈으로 유력한 게임업체들을 매수해 힘을 키워야 한다고 말한다.
열심히 좋은 제품만 만들면된다는 장인정신의 슈퍼마리오는 소니나 MS처럼 공격적인 M&A에 익숙치 않다. ‘시니세’의 정신이 오히려 글로벌 경쟁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슈퍼마리오가 난관을 이겨내고 ‘피치 공주’를 구출할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국제 많이 본 뉴스
-
1
비상계엄 해제 '숨은 공로'···국회 표결 시스템 관리 직원들도 그날 담벼락 넘었다
-
2
SK하이닉스, 'AI 반도체 패키징' 신사업 추진
-
3
망분리 개선 정책, 'MLS'서 'N²SF'로 간판 바꿨다
-
4
단독현대차, 20년 만에 '新 1톤 트럭' 개발…2027년 생산
-
5
野, 12일 두 번째 尹 탄핵안 발의…“새 내란 사실 추가”
-
6
구글, AI 모델 '제미나이 2.0' 출시…“AI 에이전트 최적화”
-
7
한동훈 “尹 담화 예상 못해…제명·출당 위한 윤리위 긴급 소집”
-
8
속보尹 “마지막까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충정 믿어달라”
-
9
폭스바겐 신형 투아렉…“어떤 길도 거침없는 프리미엄 SUV”
-
10
속보尹 “野, 비상계엄이 내란죄라고 광란의 칼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