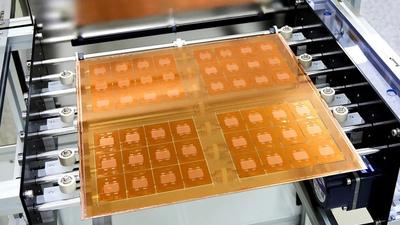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주요 휴대인터넷 기술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주요 휴대인터넷 기술 상반기 KT, 하나로통신 등 사업자들의 잇단 기술시연에 이어 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하반기부터 기술표준화 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어서, 조만간 2.3㎓ 휴대인터넷을 둘러싼 기술방식 논쟁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플래시-OFDM, 아이버스트 등 외산기술과 ETRI가 개발중인 국산기술 HPi(High speed Portable Internet) 가운데 어느 것을 채택하느냐가 논쟁의 핵심이다.
조기상용화가 가능한 외산기술과 달리 HPi의 상용화 시점은 오는 2006년께다. 외산·국산의 논란은 곧 휴대인터넷 서비스 시기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전문가들은 휴대인터넷 기술방식 선정에 있어 무엇보다 서비스 시기와 상용화기술, 세계표준, 로열티 협상, 장비 국산화, 3G이후 기술과의 연계성 등의 기준을 면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연구계, 업계 차원에서 이같은 선정기준에 대해 조속한 공감대를 이뤄내야 한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기술방식 선정, 국산이냐 외산이냐=통신사업자들의 시범서비스 과정에서 소개된 휴대인터넷 기술은 어레이콤의 아이버스트, 플라리온의 플래시-OFDM, 나비니의 립웨이브, 브로드스톰의 브로드에어(Broad@ir), 런콤의 DVB(칩) 등이다. 이들 외산기술은 조기 상용서비스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핵심기술 대부분을 개발한 상황이어서 국산시스템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로열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벌써부터 국산주전산기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KT, 하나로통신 등 유선통신사업자들은 이같은 이유를 들어 외산기술을 도입해서라도 조기상용화를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LG전자와 포스데이타는 각각 어레이콤과 브로드스톰과 협력해 내년 이후 상용 장비를 출시할 계획을 세워 놓은 상태다.
외산기술의 조기 상용화에 비해 ETRI를 중심으로 개발중인 HPi의 상용화는 2006년께로 늦다. 하지만 늦더라도 로열티 문제나 장비, 단말기 개발에서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지자는 게 HPi기술론자들의 입장이다. 삼성전자 등 개발프로젝트에 참여한 업체들도 독자 시스템 개발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표준화 작업에 관여하고 있는 한 전문가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 일단 외산기술로 상용화한 뒤 HPi가 개발되면 이를 통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이 적합하다고 본다”며 “HPi 도입시기를 3세대 이후 세계표준 논의가 시작되기 직전인 2006년으로 맞추는 게 국내 IT산업의 기술로드맵 측면에도 적합하다”며 조기상용화를 옹호했다.
하지만 두 방식의 호환은 물론 선투자 문제로 인해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겠느냐라는 비판론도 만만찮다. 처음부터 국산기술에 무게중심을 두고 서비스 일정을 짜야만 서비스 도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HPi기술론자들의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로열티 협상이 관건=외산기술이든 국산기술이든 현재로선 외국의 로열티 협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추후 HPi로 업그레이드하더라도 로열티 협상이 관건인 셈이다. 특히 위피의 사례에서 보듯 표준 개발시에는 지적재산권(IPR)을 주장하지 않다가 도입시나 시장형성기에 가서야 로열티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철저한 사전대응이 요구된다.
휴대인터넷기술이 3세대 이후 차세대 이동통신과 맥이 닿아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로열티 협상은 한층 더 중요해진다. 이에 대해 TTA측은 표준연구시부터 IPR전담반을 따로 둬 로열티 협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도입시부터 외산기술간 경쟁을 적절히 유도하면 로열티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국산 시스템이냐, 외산 시스템이냐는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기술방식에 대한 로드맵을 확정하는 것이 휴대인터넷 서비스의 주도권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