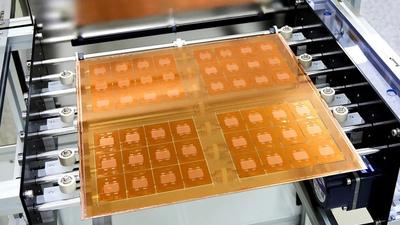‘감추고 싶은 자회사와의 시너지 효과?’
지난주 KTF의 1분기 실적 공개에서 모회사인 KT의 무선재판매 현황이 알려지자 그동안 양사가 속사정 밝히기를 꺼려왔던 이유가 드러나고 있다.
무선재판매는 KT가 자회사인 KTF의 가입자를 대신 유치해 기본료와 통화료 수입을 배분받는 효자사업. 당초에는 모회사인 KT의 막강한 영업기반을 활용, 양사 모두에 실익을 가져다줄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지만 속내를 보면 KT만 남는 장사를 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지난 1분기 KTF는 14만4000명의 가입자가 줄었지만 KT가 무선재판매를 통해 18만6000명을 유치한 덕분에 4만2000명 가량 증가했다. KTF의 체면을 KT가 지켜줬던 셈.
그러나 지난해 5월 이후 KT의 무선재판매 가입자는 36% 이상 증가했지만 이로 인한 KTF의 매출은 24% 상승에 그쳤다. 특히 1분기 매출은 511억원으로 오히려 전 분기 522억원보다 감소했다. KT의 무선재판매 가입자가 실적에는 그다지 기여하지 못하는 불량 가입자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반면 무선재판매로 얻는 수익의 배분 비율은 KT와 KTF가 각각 51대 49로 KT가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었다. 덕분에 KT는 지난 1분기 무선재판매 부문에서 작년 동기대비 40% 이상 급증한 2346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동종업계 관계자는 “이동전화가입 유치 비용을 전부 따진다해도 20∼30% 정도면 충분하다”면서 “KTF가 실적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절반 이상을 KT가 가져가는 수익모델로는 윈윈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특히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가 연내 130만 가입자를 유치할 EVDO 서비스도 재판매 이익배분 비율은 마찬가지여서 주변에서는 비판적인 시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KTF 홍영도 재무실장은 지난주 콘퍼런스 콜을 통해 “재판매는 KT와 KTF 모두에 이익이 되는 윈윈전략”이라며 “연내 휴대단말기(PDA)나 무선LAN 사업으로 확대해 이익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모토로라 중저가폰 또 나온다…올해만 4종 출시
-
2
단독개인사업자 'CEO보험' 가입 못한다…생보사, 줄줄이 판매중지
-
3
LG엔솔, 차세대 원통형 연구 '46셀 개발팀'으로 명명
-
4
역대급 흡입력 가진 블랙홀 발견됐다... “이론한계보다 40배 빨라”
-
5
LG유플러스, 홍범식 CEO 선임
-
6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7
반도체 장비 매출 1위 두고 ASML vs 어플라이드 격돌
-
8
페루 700년 전 어린이 76명 매장… “밭 비옥하게 하려고”
-
9
127큐비트 IBM 양자컴퓨터, 연세대서 국내 첫 가동
-
10
'슈퍼컴퓨터 톱500' 한국 보유수 기준 8위, 성능 10위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