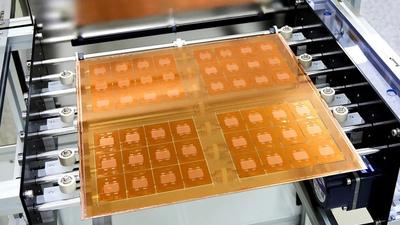신유통 채널로 각광을 받던 할인점이 출혈 가격경쟁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미끼상품’ 치고는 상품 수나 가격이 혀를 내두를 정도다. 경기 불황으로 주머니가 가벼워진 소비자에게는 반갑지만 할인점에 상품을 공급하는 제조업체는 언제 불똥이 튈지 전전긍긍하는 상황이다.
◇할인점 가격경쟁 ‘과열’=지난 98년 이마트·킴스클럽·롯데마트 등 국내 할인점에 까르푸와 홈플러스·월마트 등 외국계 할인점이 도전장을 내면서 가격인하 경쟁은 포문을 열었다. 이때까지 가격경쟁은 같은 지역의 상권 내에서 주로 벌어졌다.
전면전 양상을 띤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다. 지역별 상권내 유통매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소비심리 위축으로 목표매출에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이마트는 올초 자사상품의 구매에 상관없이 비싼 상품을 발견해 신고만 해도 일정액을 돌려준다는 ‘최저가격 신고보상제’를 들고 나왔다. 이어 3월 홈플러스가 ‘신가격정책’이라는 이름으로 500여종의 상품에 대해 최고 40%까지 가격을 내리고 동시에 한번 내린 동일품목 가격은 더 이상 올리지 않는다고 선언해 가격경쟁에 불을 붙였다.
이후 롯데마트와 까르푸가 연이어 30% 안팎의 가격인하에 나섰고 할인점 업계는 품목별로 주당 평균 1회 이상의 가격인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납품업체 ‘전전긍긍’=할인점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백화점을 제치고 단일 업종 최대의 매출을 올리는 유통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납품업체만 수천개씩 거느리고 있다.
문제는 이들 중소 납품업체가 직·간접적으로 가격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당장은 유통업체가 가격인하에 따른 손실분을 떠안겠다고 했지만 장기적으로 가면 납품업체에 원가인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 일부 할인점은 다양한 방법으로 납품업체에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각종 행사 소요비용 요구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행위지만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중소공급업체 관계자는 “가격인하 등 판촉전에 앞서 공급가 인하를 요구한다”며 “판매가 원활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재고가 발생하면 바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질서 붕괴=더 큰 문제는 가격인하로 시장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형 유통업체 한곳에서 특정상품의 가격을 파격적으로 낮춰 판매할 때 해당상품을 유통하는 여러 납품업체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생식품 등 생활 필수품이 아닌 소형가전 등 공산품의 경우 도산까지 이어지게 만들 수 있다.
대형 할인점에 소형가전을 납품하는 한 업체 사장은 “할인점들이 가격경쟁을 확대하면서 소형가전을 납품하는 도매업자와 벤더 사이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할인점 한곳에서 가격을 내리면 따라서 같이 내리거나 아니면 물건을 빼야 하기 때문이다”고 토로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표/할인점 상위 5개사 점포수(단위:점)
업체 = 2001년 = 2002년 6월 = 2002년 12월 = 2005년
이마트 = 41 = 46 = 49 = 81
롯데마트 = 24 = 28 = 32 = 62
까르푸 = 22 = 22 = 25 = 38
홈플러스 = 14 = 16 = 21 = 52
월마트 = 9 = 12 = 15 = 27
많이 본 뉴스
-
1
모토로라 중저가폰 또 나온다…올해만 4종 출시
-
2
단독개인사업자 'CEO보험' 가입 못한다…생보사, 줄줄이 판매중지
-
3
LG엔솔, 차세대 원통형 연구 '46셀 개발팀'으로 명명
-
4
역대급 흡입력 가진 블랙홀 발견됐다... “이론한계보다 40배 빨라”
-
5
LG유플러스, 홍범식 CEO 선임
-
6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7
반도체 장비 매출 1위 두고 ASML vs 어플라이드 격돌
-
8
페루 700년 전 어린이 76명 매장… “밭 비옥하게 하려고”
-
9
127큐비트 IBM 양자컴퓨터, 연세대서 국내 첫 가동
-
10
'슈퍼컴퓨터 톱500' 한국 보유수 기준 8위, 성능 10위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