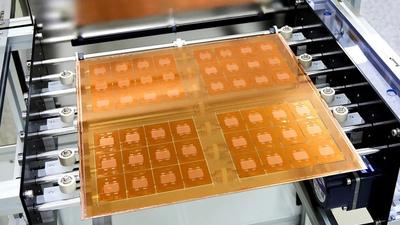“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인터넷은 세상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도구죠. 차별에 대한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장애를 초월할 수 있게 해준답니다.”
여의도의 한국장애인총연합회 사무실에서 만난 이봉현씨(38)는 20일 있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거리행사 준비로 분주했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중증장애인의 집을 직접 방문해 컴퓨터를 가르치는 방문교사로 일하고 있다.
언뜻 보기에는 장애를 느끼기 어려운 ‘멀쩡한’ 그지만 대학을 졸업하던 해 뇌종양에 걸려 반신불수가 된 후 아직도 충분히 회복되지 못했다.
“사실 내가 장애인임을 인정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난 다른 장애인과 다르다고 생각했었지요. 방문교사를 하면서 다른 장애인과의 동질감과 삶에 대한 자부심을 새롭게 다지게 됐습니다. 뇌종양 수술 후 6년여를 병치레로 집에만 머물렀으니까 첫번째 사회진출이라는 의미도 있죠.”
하지만 방문강사 활동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두번째 강습생이었던 하반신 마비의 69세 독거노인은 수업을 시작한 지 단 2회만에 중도하차했다. 너무 어려워서 더 이상 못배우겠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어른은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서 교육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리워서 신청했다더군요.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러셨겠어요. 장애인 정보화교육은 단순한 컴퓨터 교육이 아니란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장애인 정보화를 추진할 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만남과 정이 우선이라는 얘기다. 물론 교육은 교육이니 만큼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장애인이 장애인을 가르치게 되면 상대방이 정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사소한 점까지 배려할 수 있어 교육효과도 높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인생에 대한 긍지를 느끼게 된다고.
그는 최근 국내 3대 장애인단체 중 하나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정식으로 취직했지만 주말을 이용해 방문교사 활동을 계속할 생각이다. 봉사한다는 의미에서다.
“뇌종양수술 후 수년 동안을 말도 못하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제가 살아있는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서야 겨우 거동을 할 수 있게 된 제게 컴퓨터 방문교사 활동과 협회 일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합니다.”
물론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세상의 벽은 넓고도 높다. 정보화도 예외가 아니다.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는 시각장애인에게는 무용지물이고 컴퓨터 교육장이라고 마련된 곳에 휠체어도 넘기 어려운 턱이 수두룩한가 하면 장애인용으로 개발된 정보화기기들은 대개가 수십만원대를 호가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구입할 엄두도 못낸다.
그의 마지막 말은 장애인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기에 충분하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장애인 방문교사로 신청한 사람은 10명도 채 안됩니다. 교사 선정시 장애인을 우대하는 데도 일단 겁부터 먹고 신청을 안하는 것 같아요.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지 못해도 되니까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세요!”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SW 많이 본 뉴스
-
1
모토로라 중저가폰 또 나온다…올해만 4종 출시
-
2
단독개인사업자 'CEO보험' 가입 못한다…생보사, 줄줄이 판매중지
-
3
LG엔솔, 차세대 원통형 연구 '46셀 개발팀'으로 명명
-
4
역대급 흡입력 가진 블랙홀 발견됐다... “이론한계보다 40배 빨라”
-
5
LG유플러스, 홍범식 CEO 선임
-
6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7
반도체 장비 매출 1위 두고 ASML vs 어플라이드 격돌
-
8
페루 700년 전 어린이 76명 매장… “밭 비옥하게 하려고”
-
9
127큐비트 IBM 양자컴퓨터, 연세대서 국내 첫 가동
-
10
'슈퍼컴퓨터 톱500' 한국 보유수 기준 8위, 성능 10위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