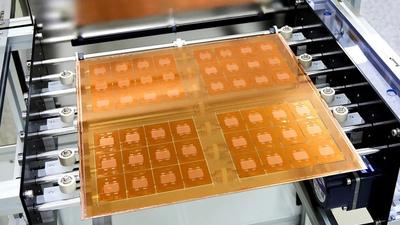하이테크 경기가 호황일 때 수만명의 근로자들이 ‘기회의 땅’ 실리콘밸리로 몰려들었다.
세계 각지의 근로자들이 인터넷 경제 붐을 타고 숨가쁜 속도로 팽창하던 시스코시스템스와 휴렛패커드(HP) 같은 실리콘밸리의 저명한 기술업체에 취업했다. 실리콘밸리 10대 하이테크업체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이 이 번영을 구가했다.
새너제이 머큐리뉴스가 실리콘밸리 주요 하이테 업체의 고용관련 기록을 최근 분석한 결과, 기술 호황기에 여성·흑인·라틴계 등의 고용촉진을 위해 하이테크업계가 수백만달러의 고용장려 비용을 투입했으나 정작 아시아계가 가장 많이 고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아시아계는 소수계 중 유일하게 고용비율이 증가한 그룹으로 꼽혔다. 지난 96년부터 2000년까지 실리콘밸리 10대 기업 고용자 10명 중 거의 3명이 아시아계 근로자였다. 아시아계는 보통 고등교육을 받은 이들로 높은 보수를 받는 엔지니어로 일했다.
반면 전체적으로 흑인과 라틴계의 고용증가는 미미했다. 2000년에 고용자 10명 중 흑인이나 라틴계는 1명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은 여성들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여성 근로자는 96년 실리콘밸리 전체 근로자의 35% 가량을 차지했으나 호황기 말에는 그 비율이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오거니제이션리소시스카운셀러스의 경영 컨설턴트인 마이클 파인만은 “직원의 다양성에 관심을 쏟는 기업들은 이런 고용추세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 엔지니어들의 약진은 이들 중 상당수가 호황의 주축을 이룬 기술분야의 숙련된 근로자라는 점이 배경이 됐다. 미 국립과학재단(NSF)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해 중국·인도·대만·일본은 매년 미국의 거의 3배에 달하는 60만명 정도의 이공계 대학 졸업자를 배출한다. 아시아계는 미국내 인구비중이 4%에 못 미치지만 미국 대학의 이공계 분야 학사학위 취득비율은 거의 8%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추세가 실리콘밸리 하이테크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많은 근로자가 실리콘밸리나 해외에서 자신들의 기업을 창업하는 데 실리콘밸리의 대기업 경력을 발판으로 삼기 때문이다.
칩 메이커 인텔의 투자 계열사인 인텔캐피털에서 투자대상 신생회사를 선별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스리램 비스와나탄은 “내가 만난 기업가의 상당수가 대기업 배경을 가지고 있다”며 “이들 기업은 모든 분야의 기술개발을 장려하는 관계로 남과 다른 독자적인 길을 가는 기업가적 사고를 가져다준다”고 밝혔다.
그는 실리콘밸리에서 많은 신생사의 기술책임자는 아시아계가 차지하고 있으나 최고경영자(CEO)는 백인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이런 근본적 차이점은 대기업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아시아 근로자들은 보통 고위기술직으로 일하지만 매니저나 판매직은 백인이 훨씬 많다.
아시스 굽타(27)는 인도 델리의 저명한 인도공과대학(IIT)을 졸업한 뒤 2년이 지난 98년 IBM에 직장을 얻어 실리콘밸리로 왔다. 그는 새로운 기술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에 남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나 세계 하이테크 중심지인 실리콘밸리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기회를 놓치기 싫어 미국으로 건너왔다.
굽타 같은 기술자는 지난 90년대 말에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 그는 IBM에서 겨우 7개월 일했을 때 시스코시스템스의 새 일자리 제의를 받고 몇 주 만에 이를 받아들였다.
시스코는 실리콘밸리 기업 중에서도 호황기에 가장 빠르게 성장한 기업이었다. 이 업체는 동시에 굽타 같은 아시아계 근로자 고용을 대폭 늘렸다.
시스코의 인력담당 수석부사장 케이트 드캠프는 “우리는 지난 97년 직원수가 8821명에서 98년에 1만2688명으로 50%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아시아계는 시스코에서 흑인이나 라틴계와 마찬가지로 판매부서 일자리를 얻기가 힘들었다. 미 연방 고용자료를 보면 2000년에 판매부문에 근무하는 아시아계가 46명이면 흑인은 43명, 라틴계가 48명이고 백인은 이보다 훨씬 많은 1957명에 달했다.
판매직은 급여체계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해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고임금의 상위직으로 승진할 가능성은 더 크다.
머큐리뉴스가 조사한 10개 회사 모두가 판매관련 직종에 소수계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직 근로자의 90% 정도는 백인이었다.
기술 지도자들은 아시아계의 판매직 종사자가 적은 이유는 언어와 의사소통상 장애가 있고 판매직의 성공이 문제해결 능력보다는 개인적 인맥에 좌우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샌타클래라의 업계 단체로 회원수가 3000명에 달하는 중국정보네트워킹협회(CINA) 전 회장 시펑 사오는 “판매직으로 성공하려면 인맥이 있어야 하고 인맥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며 “아시아계 다수가 기술직에 종사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을 상대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있다”고 설명했다.
사오는 “중국 기술자들은 판매 및 마케팅 직종이 승진기회가 더 많다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했다”며 “기술자로 경력이 쌓여도 새로운 것을 배우기는 어려워지는 반면 판매와 마케팅 분야는 경력이 오래될수록 인맥이 형성돼 자신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해석했다.
아시아계 모두가 하이테크업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중국과 인도 출신 기술자들ㅇ은 많이 배출되는 반면 베트남·필리핀 등 다른 동남아 국가의 전문직종은 다른 분야에 진출하는 사례가 많다.
선마이크로시스템스의 국제업무담당 수석부사장인 마리사 피터슨은 “필리핀인들은 전통적으로 의료분야에서 강세를 보여 상당수가 의사와 간호사들이며 기술분야 종사자는 많지 않다”고 밝혔다.
아시아계 이민자들은 25년 전 자신들이 처음 실리콘밸리에 발을 붙이기 시작할 때와 비교해 실리콘밸리의 대형 기술업체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현재 남캘리포니아대학(USC)에서 캐서린 앨런 교수의 경영학 강좌를 듣는 학생의 3분의 1이 아시아계며 이 중 다수가 석박사 학위를 가진 아시아계 기술진으로 이들은 기업경영을 배우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이다.
앨런 교수도 “아시아계의 기업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USC가 올해 실시한 기업가 행위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인용해 “아시아 대학들이 신생 벤처창업에, 미국 대학들은 기술 라이선스에 더 관심이 많다”고 덧붙였다.
굽타는 언젠가는 부인과 함께 인도로 돌아가 시스코에서 배운 기술을 살려 독자적인 회사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 꿈은 대기업 계열사나 내 자신의 회사로 독립해 일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스코의 중국인 기술진인 만칭 황도 고국인 중국에서 나중에 자신의 회사를 경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스코 같은 선진 기술업체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보겠다”며 “중국에는 이런 기업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제 많이 본 뉴스
-
1
모토로라 중저가폰 또 나온다…올해만 4종 출시
-
2
단독개인사업자 'CEO보험' 가입 못한다…생보사, 줄줄이 판매중지
-
3
LG엔솔, 차세대 원통형 연구 '46셀 개발팀'으로 명명
-
4
역대급 흡입력 가진 블랙홀 발견됐다... “이론한계보다 40배 빨라”
-
5
LG유플러스, 홍범식 CEO 선임
-
6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7
반도체 장비 매출 1위 두고 ASML vs 어플라이드 격돌
-
8
페루 700년 전 어린이 76명 매장… “밭 비옥하게 하려고”
-
9
127큐비트 IBM 양자컴퓨터, 연세대서 국내 첫 가동
-
10
'슈퍼컴퓨터 톱500' 한국 보유수 기준 8위, 성능 10위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