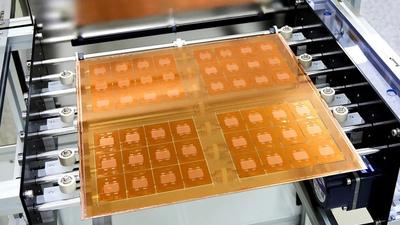대덕밸리가 시험대에 올랐다.
IMF 이후 4년여 만에 불어닥친 국내 경기침체의 늪에서 대덕밸리도 쉽게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그동안 활발하게 이뤄지던 신규 R&D 투자도 올해 들어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1∼2년 전 자금 유치에 성공해 비교적 여유가 있는 업체들은 그나마 계획대로 제품 개발 일정을 맞춰가고 있지만 이 역시 소수에 불과하다.
대다수의 업체들이 잠수했다는 표현이 오히려 나을 듯싶다. 모두들 숨을 죽인 채 시장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이미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문을 닫거나 쓰러지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생존을 위한 M&A 움직임이 그 어느때보다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치열한 시장경쟁 논리에 의해서다.
그에 비하면 대덕밸리는 상황이 비교적 나은 편이다.
회사 경영에 어려움은 있어도 쓰러지는 업체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물론 이는 대덕밸리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구조 때문이다.
대다수의 벤처 구성원들이 기술력이 뛰어난 연구원 출신이다 보니 연구소 용역을 따내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이미 많은 업체들이 회사 고유제품 개발은 미뤄 둔 채 용역으로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형편이다. 물론 지금과 같은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점도 이해는 한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용역만으로도 얼마든지 회사를 지탱할 수 있는데 신제품 개발을 위해 굳이 머리를 싸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발상은 궁극적으로 대덕밸리의 발전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몇몇 업체들은 규모가 비교적 큰 곳인데도 불구하고 1∼2년 전부터 아예 용역사업으로 돌아선 곳도 있다. 보다 나은 제품 개발과 자기 계발을 위한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다 보면 업체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이는 결국 대덕밸리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외부의 시각은 냉철하다. 용역에 안주하다 보면 대덕밸리라는 울타리 안에서 생존할 수는 있어도 진정한 벤처로 거듭나기는 어렵다.
<대전=과학기술부·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모토로라 중저가폰 또 나온다…올해만 4종 출시
-
2
단독개인사업자 'CEO보험' 가입 못한다…생보사, 줄줄이 판매중지
-
3
LG엔솔, 차세대 원통형 연구 '46셀 개발팀'으로 명명
-
4
역대급 흡입력 가진 블랙홀 발견됐다... “이론한계보다 40배 빨라”
-
5
LG유플러스, 홍범식 CEO 선임
-
6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7
반도체 장비 매출 1위 두고 ASML vs 어플라이드 격돌
-
8
페루 700년 전 어린이 76명 매장… “밭 비옥하게 하려고”
-
9
127큐비트 IBM 양자컴퓨터, 연세대서 국내 첫 가동
-
10
'슈퍼컴퓨터 톱500' 한국 보유수 기준 8위, 성능 10위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