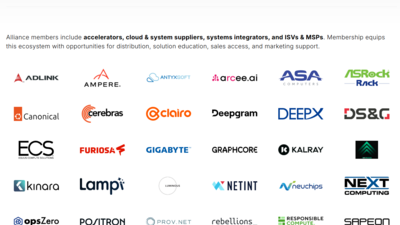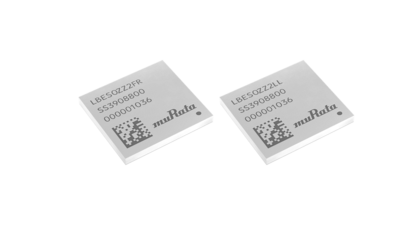박재성 정보통신부장 (jspark@etnews.co.kr)
인류 태초의 길은 동물의 이동로였을 것이라는 얘기는 설득력이 있다. 인간은 동물이 이동하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수렵을 했다. 그 길을 통해 사냥한 짐승을 가지고 주거지로 돌아왔다. 그렇게 하다보니 산과 들에 오솔길이 생겨났던 것이다.
자급자족 경제체제가 끝나고 교환경제체제에 진입하면서 길은 더욱 멀리 뻗어나갔다. 실크로드가 대표적이다. 기원전 2세기부터 낙타나 말을 탄 캐러밴은 동방에서 비단을 싣고 서역으로 향했다. 돌아오면서 그들은 보석이나 직물 등을 가지고 왔다. 그 길에는 온갖 상품은 물론 종교도 오갔다. 그렇게 해서 7세기까지 닦인 길은 중국 장안에서 험준한 파미르 고원을 지나 터키 이스탄불과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까지 뻗어나갔다.
실크로드가 대상들에 의해 자연적으로 생긴 길이었다면, 로마의 길은 인위적으로 닦아 만든 고속도로였다. 로마의 재무관이자 명문가 출신인 아피우스는 기원전 312년 아피아가도를 건설, 개통했다. 널찍했던 이 길은 꼬리를 물어 기원전 107년에는 로마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직선으로 연결했다. 이른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던 것이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길에 대한 개념을 바꿔놓았다. 19세기 초반 증기엔진의 발명은 조수와 바람의 장벽을 뛰어넘었다. 증기엔진을 단 미국 사바나호가 마침내 1819년 대서양을 건넜다. 유럽의 자본은 남미·아프리카·아시아에 철도를 놓았다. 해상과 육상을 통해 사람과 물자를 더욱 안전하고 빠르며 편리하게 운송할 수 있는 길을 열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20세기초 세계경제는 평화와 성장의 시기를 경험했다. 인류는 태고적부터 지금까지 국토의 동맥인 길을 통해 거의 모든 것을 얻어냈다.
2000년대를 눈앞에 둔 지금 또 하나의 새로운 길이 등장했다. 정보고속도로가 그것이다. 대량의 정보가 초고속으로 오가는 네트워크다. 현재로선 인터넷이 가장 근접한 모습을 띠고 있다. 완성된 모습은 초고속 유·무선망뿐 아니라 위성·케이블TV 등의 모든 통신망과 컴퓨터·가전기기·응용시스템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게 된다.
이 개념은 지난 92년 미국 앨 고어 부통령이 클린턴 정부에서 정보고속도로 청사진을 펼쳐보임으로써 세상에 퍼졌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은 TV나 PC 같은 기기를 정보고속도로에 연결할 때 가구당 약 10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내다봤다. 1억 가구인 미국은 어림잡아 100조원이 든다.
그런데도 미국은 세계에서 두번째 가라면 서러워 할 만큼 체계적으로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그만한 투자가치가 있다는 계산이다.
우리나라도 정보통신 인프라분야의 절대적인 투자규모는 작지 않다. 자체적으로 망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은 안방에까지 초고속망을 연결하려 하고 있으며, 망이 없는 사업자들은 망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그런데도 사용자들은 초고속망의 속도가 느리다느니, 어떤 지역에선 서비스가 안된다느니 온통 불만투성이다. 이들이 이동전화가 잘 안터진다고 해서 또다른 서비스에 가입, 이동전화 두개를 가지고 다니지 않듯 통신망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두개에 가입할 수도 없는 일이다. 여러 사업자들이 제각각 투자를 단행함으로써 개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 같다.
중복투자의 문제는 시장에서 움직이는 사적 의사결정자인 「시장의 지식(Market Knowledge)」이 약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여기에다가 중앙정부 의사결정권자들의 집단적인 지성인 「정부의 지식(Government Knowledge)」도 약해 정부가 조정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대로 두면 개선될 여지가 별로 없다는 데 있다. 미국이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경제회의를 중심으로 정보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이러한 기구는커녕 정부부처가 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보고속도로에 병목이 생긴다면 우리는 새 밀레니엄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2300년 전 로마의 길을 닦은 아피우스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다면 무슨 말을 할까.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비상계엄 해제 '숨은 공로'···국회 표결 시스템 관리 직원들도 그날 담벼락 넘었다
-
2
SK하이닉스, 'AI 반도체 패키징' 신사업 추진
-
3
망분리 개선 정책, 'MLS'서 'N²SF'로 간판 바꿨다
-
4
단독현대차, 20년 만에 '新 1톤 트럭' 개발…2027년 생산
-
5
野, 12일 두 번째 尹 탄핵안 발의…“새 내란 사실 추가”
-
6
구글, AI 모델 '제미나이 2.0' 출시…“AI 에이전트 최적화”
-
7
한동훈 “尹 담화 예상 못해…제명·출당 위한 윤리위 긴급 소집”
-
8
속보尹 “마지막까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충정 믿어달라”
-
9
폭스바겐 신형 투아렉…“어떤 길도 거침없는 프리미엄 SUV”
-
10
조국, 징역 2년 실형 확정…5년간 출마 못해
브랜드 뉴스룸
×
![]()